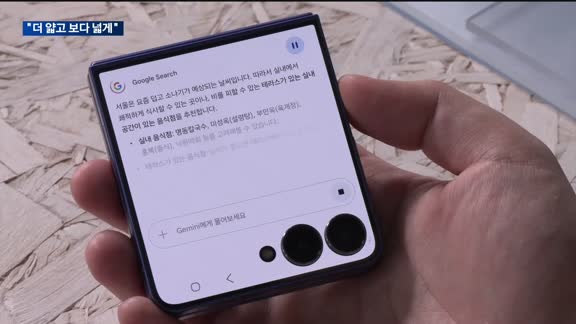국내 최초의 상업용 원자력발전소인 고리 1호기 해체가 26일 최종 승인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이날 결정에 따라 고리 1호기는 2017년 영구 정지 이후 8년 만에 본격적인 해체 절차에 돌입하게 됐다. 12년간 1조700억원이 투입될 이번 사업은 단순한 노후 시설의 철거가 아니다. 급성장하는 원전 해체 시장에서 한국이 선도국으로 도약할 기회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따르면 지난 20일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영구 정지된 원전은 215기에 이르지만, 해체가 완료된 사례는 25기에 불과하다. 2050년까지 600기 이상의 해체가 예상되며, 그 시장 규모만 500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대형 상업용 원전을 해체한 국가는 미국뿐이다. 이 틈새가 한국에는 기회다.
한국은 이미 탄탄한 기술 인프라를 갖췄다.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총 96개의 해체 핵심 기술을 확보했고, 현대건설과 두산에너빌리티는 미국 원전 해체 프로젝트에 참여하거나 핵연료 저장 기술을 수출한 경험이 있다. 원전해체연구소는 해체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있으며, 정부는 2030년까지 전문인력을 2500명으로 늘린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그러나 넘어야 할 장벽 역시 만만치 않다. 고리 1호기 습식저장소에 보관 중인 사용후핵연료를 반출할 건식저장시설은 2030년 완공 예정이며, 중간저장시설과 영구처분장은 각각 2050년과 2060년 완공이 목표다. 용지를 확정해 시설을 지으려면 주민 동의가 필수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해체 과정의 투명성 확보, 방사선 안전 기준의 엄격한 준수, 주민과의 소통을 통해 신뢰를 얻어내야 한다.
고리 1호기 해체에 성공하면 한국은 원전 설계부터 해체까지 '전(全) 주기 기술국'이 된다. 향후 해외 원전 발주처에 '설계-운영-해체-부지 복원'을 아우른 패키지 수출 전략 제시가 가능해진다. '해체+소형모듈원자로(SMR)' 복합 프로젝트도 제안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와 산업계는 이번 해체를 미래를 여는 전략사업으로 인식해야 한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따르면 지난 20일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영구 정지된 원전은 215기에 이르지만, 해체가 완료된 사례는 25기에 불과하다. 2050년까지 600기 이상의 해체가 예상되며, 그 시장 규모만 500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대형 상업용 원전을 해체한 국가는 미국뿐이다. 이 틈새가 한국에는 기회다.
한국은 이미 탄탄한 기술 인프라를 갖췄다.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총 96개의 해체 핵심 기술을 확보했고, 현대건설과 두산에너빌리티는 미국 원전 해체 프로젝트에 참여하거나 핵연료 저장 기술을 수출한 경험이 있다. 원전해체연구소는 해체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있으며, 정부는 2030년까지 전문인력을 2500명으로 늘린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그러나 넘어야 할 장벽 역시 만만치 않다. 고리 1호기 습식저장소에 보관 중인 사용후핵연료를 반출할 건식저장시설은 2030년 완공 예정이며, 중간저장시설과 영구처분장은 각각 2050년과 2060년 완공이 목표다. 용지를 확정해 시설을 지으려면 주민 동의가 필수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해체 과정의 투명성 확보, 방사선 안전 기준의 엄격한 준수, 주민과의 소통을 통해 신뢰를 얻어내야 한다.
고리 1호기 해체에 성공하면 한국은 원전 설계부터 해체까지 '전(全) 주기 기술국'이 된다. 향후 해외 원전 발주처에 '설계-운영-해체-부지 복원'을 아우른 패키지 수출 전략 제시가 가능해진다. '해체+소형모듈원자로(SMR)' 복합 프로젝트도 제안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와 산업계는 이번 해체를 미래를 여는 전략사업으로 인식해야 한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화제의 뉴스
오늘의 이슈픽
인기 영상
가장 많이 본 뉴스
- 1미국행 해상운송비 대폭 상승…"컨테이너선 부족"
- 2증시 오늘 '핫이슈'…"이재용 회장 대법 선고, 삼...
- 3삼성전자와는 다른 행보…LG전자, 중국기업 활용해 ...
- 4[CEO인사이트] 나용수 서울대 원자핵공학과장 "2...
- 5SGI서울보증 "신속한 복구와 고객 피해 최소화위해...
- 6[CEO인사이트]'게임체인저'로 떠오른 '핵융합'…...
- 7[CEO인사이트] 태양 품은 자들의 도시…핵융합이 ...
- 8아크, AI 망막 진단 솔루션 'WISKY' 출시 ...
- 9상승장에도 공매도 급증…숏커버링에 올라탈 때?
- 10[CEO인사이트] '제2의 태양'을 만들어라…시작된...
투데이 포커스
화제의 뉴스
포토뉴스
![[집중취재]'한국콜마 사태' 경영권 놓고 '남매의 난' 격화](https://imgmm.mbn.co.kr/vod/news/103/2025/07/10/20250710162703_10_103_0_MM1005607019_4_296.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