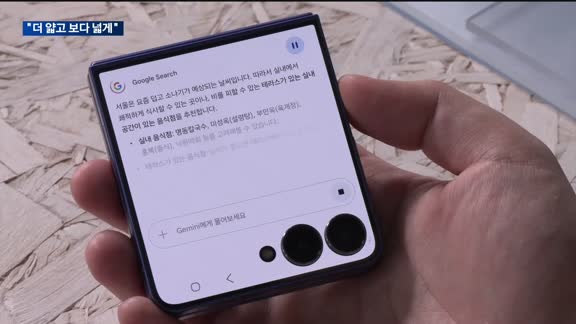|
2년 전 인근 아파트 전세가 나왔다. 임차인 A씨가 만기 전에 이사를 나가야 해서 여러 중개사사무소에 임대 의뢰를 한 것이다. 마침 전셋집을 구하던 B씨가 계약하게 되었고 잔금 날까지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됐다.
문제는 2년 후에 발생했다. 새 임차인 B씨는 전세 만기 시점에 2년 재계약을 하기 위해 전세대출 연장 신청을 했고, 은행 측이 대출 연장 심사를 위해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열람해 보니 전 임차인 A씨의 임차권등기명령이 기재돼 있었다. 전 임차인 A씨는 왜 이사 나간 집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것일까.
전말은 이랬다. 상황이 급했던 A씨는 이삿날에 이삿짐도 서둘러 빼냈다. 임대 기간 나름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했던 임대인이 새 임차인 B씨에게서 전세보증금이 입금됐지만 하필 연체돼 있던 카드값과 은행 대출금이 빠져나가는 바람에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돈이 부족해졌다는 것이다. 임차인 A씨가 임대인으로부터 직접 반환받을 보증금은 전세금 2억5000만원 중 5000만원이었다. 나머지 보증금은 임대인이 직접 은행으로 반환해야 하는 채권 양도 형식의 전세대출금이었다. A씨는 5000만원만 본인 자금이고 나머지는 은행에 상환해야 하는 금액인지라 임대인이 은행 전세대출금을 상환하겠다고 한 약속을 믿고 본인 부담금만 반환받아 새집으로 입주했다.
하지만 갑작스레 닥친 경제적인 어려움은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 전세대출금 상환을 차일피일 미루던 임대인이 결국 손을 들자 전세대출금의 원채무자인 임차인 A씨에게 모든 책임이 밀려 왔다. 결국 6개월 후 뒤늦게나마 보증금 미반환을 이유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했다. A씨가 임대인에게 아직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공적으로 증명하고 향후 법적 대응을 위한 권리를 확보하기 위함이다.
새 임차인 B씨는 전세대출 연장 불가 판정을 받으며 그제야 전말을 알게 된 것이다. 전 임차인 A씨가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해 뒤늦게 임차권등기명령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도 안타깝지만 새 임차인 B씨 역시 전세대출 연장도 못하고(연체 이자 발생) 보증금 반환도 못 받으며 불안에 떨 수밖에 없게 된 사정 역시 딱하다.
새 임차인 B씨는 전 임차인 A씨의 임차권등기명령으로 인해 보증금 반환 순위가 밀려날까 봐 걱정했다. 2년 전 A씨는 이미 이사 나갔고, B씨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은 후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선순위 대항력을 확보한 것이라고 설명해도 B씨는 안심하지 못했다.
다행히 최근 유사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에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은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에만 성립하며 계약 기간 내 점유 상실 시 자동 소멸하는 것으로 봤다. 또 임차권등기의 효력은 등기 시점부터 새롭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부여하는 것이며 과거에 존재하던 대항력을 소급해 부활시키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즉 임차권등기는 과거 보호 수단이 아닌 미래 보호 수단이라는 것이다. 간혹 불가피한 사정 발생 시 주소만 남겨두고 미리 이사 나가는 경우가 있다. 이번 판결은 전입신고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해서 그 집에 사는 것과 같은 권리가 유지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크나큰 오판이라는 것을 일깨운다. 전입신고만으로는 안 되고 점유의 지속성도 확보돼야 비로소 임차인의 권리가 완성되는 것이다.
돌발 상황 발생 시에는 이삿짐 차를 되돌리더라도 점유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원칙을 지키는 똑똑한 임차인이 전세보증금도 지킨다.
[양정아 공인중개사]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화제의 뉴스
오늘의 이슈픽
인기 영상
가장 많이 본 뉴스
- 1미국행 해상운송비 대폭 상승…"컨테이너선 부족"
- 2증시 오늘 '핫이슈'…"이재용 회장 대법 선고, 삼...
- 3삼성전자와는 다른 행보…LG전자, 중국기업 활용해 ...
- 4[CEO인사이트] 나용수 서울대 원자핵공학과장 "2...
- 5[CEO인사이트]'게임체인저'로 떠오른 '핵융합'…...
- 6SGI서울보증 "신속한 복구와 고객 피해 최소화위해...
- 7[CEO인사이트] 태양 품은 자들의 도시…핵융합이 ...
- 8[CEO인사이트] '제2의 태양'을 만들어라…시작된...
- 9아크, AI 망막 진단 솔루션 'WISKY' 출시 ...
- 10상승장에도 공매도 급증…숏커버링에 올라탈 때?
투데이 포커스
화제의 뉴스
포토뉴스
![[집중취재]'한국콜마 사태' 경영권 놓고 '남매의 난' 격화](https://imgmm.mbn.co.kr/vod/news/103/2025/07/10/20250710162703_10_103_0_MM1005607019_4_296.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