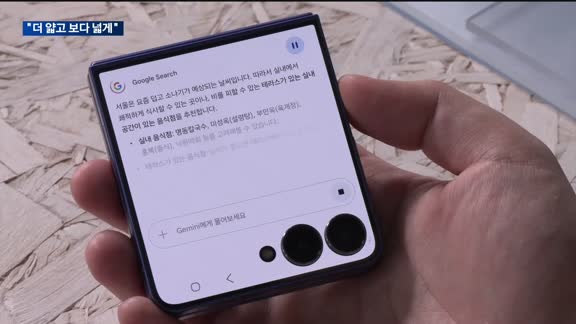인류가 통제할 수 없는 재앙 ‘메가파이어’ 막으려면
 |
| 조엘 자스크 지음/ 이채영 옮김/ 필로소픽/ 1만8000원 |
최첨단 장비와 수많은 인력을 동원해도 통제되지 않는 초대형 산불 이른바 ‘메가파이어’는 강도, 확산 속도, 범위, 영향 등 모든 면에서 과거 산불과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인다. 인류가 초래한 기후 변화 탓에 지구가 그 어느 때보다 불에 타기 좋은 상태가 돼서다. 대기는 건조하고 더위는 극심하며 바람은 강하고 산은 메마르고 단조로워졌다. 메가파이어를 진압하려면 눈비가 내리거나, 화마가 주변을 모두 집어삼키고 스스로 잠들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메가파이어는 비단 외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나라에서 피해 면적이 가장 컸던 상위 세 건의 산불은 전부 21세기에 발생했다. 불이 날 시기를 알고 만반의 준비 태세를 갖춰도 점점 피해가 커져가는 실정이다.
이 대목에서 프랑스 철학자인 저자는 산불을 대하는 태도에서 드러나는, 자연을 바라보는 인간의 두 가지 관점을 검토한다. 하나는 산업자본주의 논리 아래 자연을 무자비하게 착취하면서 산불을 철저히 통제하려는 관점이다. 다른 쪽은 자연을 불가침의 영역으로 여기며, 자연의 소관인 산불을 방임하려는 생태주의적 관점이다. 저자는 대립하는 듯한 두 입장이 모두 자연과 인간을 구분 짓는 이분법적 사고를 공고히 하는 공범이자, 메가파이어 재앙을 불러온 주범이라고 주장한다.
저자는 “산불을 막던 기존 방법으로는 메가파이어를 막을 수 없다”며 해법을 찾기 위해서는 산을 ‘자연’이 아닌 ‘경관’의 개념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촉구한다. 저자에 따르면 우리가 원시적 자연이라고 여긴 산은 인간과의 상호작용으로 탄생했다는 것. 예를 들어 코르시카섬의 털가시나무는 두꺼운 껍질과 특유의 재생 방식 덕분에 불이 나도 다치지 않는다. 털가시나무가 처음부터 그렇게 태어난 것이 아니라 인간이 불을 피우던 환경에 적응해온 결과다. 털가시나무뿐 아니라 자연과 인간은 이 지구에 함께 살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공진화했다. 인간이 자연을 필요로 하듯이 자연, 즉 경관도 인간을 필요로 한다. 우리 삶의 터전인 경관을 유지하려면 이를 조성하고 관리해야 한다는 뜻이다. 저자는 메가파이어를 막기 위해서라도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통제된 불’을 피우고 땅을 돌보던 ‘불의 문화’를 되찾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다운 기자]
[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2305호 (2025.04.16~2025.04.22일자) 기사입니다]
[Copyright ⓒ 매경이코노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화제의 뉴스
오늘의 이슈픽
인기 영상
가장 많이 본 뉴스
- 1미국행 해상운송비 대폭 상승…"컨테이너선 부족"
- 2증시 오늘 '핫이슈'…"이재용 회장 대법 선고, 삼...
- 3삼성전자와는 다른 행보…LG전자, 중국기업 활용해 ...
- 4[CEO인사이트] 나용수 서울대 원자핵공학과장 "2...
- 5SGI서울보증 "신속한 복구와 고객 피해 최소화위해...
- 6[CEO인사이트]'게임체인저'로 떠오른 '핵융합'…...
- 7[CEO인사이트] 태양 품은 자들의 도시…핵융합이 ...
- 8아크, AI 망막 진단 솔루션 'WISKY' 출시 ...
- 9상승장에도 공매도 급증…숏커버링에 올라탈 때?
- 10[CEO인사이트] '제2의 태양'을 만들어라…시작된...
투데이 포커스
화제의 뉴스
포토뉴스
![[집중취재]'한국콜마 사태' 경영권 놓고 '남매의 난' 격화](https://imgmm.mbn.co.kr/vod/news/103/2025/07/10/20250710162703_10_103_0_MM1005607019_4_296.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