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영화와 드라마에서 보던 톱스타들이 연극으로 몰려오고 있다.
과감하게 'NG 없는 무대'에 오른 그들의 연기 도전은 높이 살 만하다. 그러나 인기 배우 실물 영접의 대가는 크다. 이들의 높은 출연료에 연극 티켓 값이 10만원을 넘겼다.
티켓플레이션을 일으킨 톱스타들이 공연계로 넘어온 이유 역시 출연료다. 치솟는 배우 몸값을 감당 못해 드라마 제작 편수가 대폭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넷플릭스와 디즈니플러스 등 OTT들이 주연 배우의 회당 출연료를 수억 원까지 올려놨다. '오징어게임' 시즌2 이정재 개런티는 회당 100만달러(약 14억원)로 알려졌다.
집값처럼 한번 올라간 출연료는 잘 떨어지지 않는다. 급등한 제작비에 놀란 지상파TV와 종합편성채널들이 드라마 편성을 줄였다. 설상가상으로 경영난을 겪는 토종 OTT마저 오리지널 드라마를 축소했다. 매체를 찾지 못한 '창고 드라마'가 쌓여가고 신규 제작이 급감하면서 배우들이 일자리를 잃었다.
영화 시장도 OTT의 파상 공세에 기진맥진 상태다. 극장 개봉 한 달 만에 OTT에서 볼 수 있으니 영화관 매출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지난해 영화 관객 수는 1억2313만명으로 전년보다 1.6%(201만명) 감소했다. 코로나19 이후 회복세를 보이다 4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기대작들의 흥행 부진에 투자배급사들이 위축되면서 신작이 급감했다. 팬데믹 여파에 쌓여 있던 '창고 영화'도 거의 털어내 이제 극장에 걸 작품이 부족하다. 대형 투자배급사가 올해 개봉하려는 30억원 이상 상업영화는 10편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속도감 넘치는 숏폼 콘텐츠 대세에 OTT마저 긴 호흡의 한국 영화 편성을 꺼려 입지가 더욱 좁아지고 있다.
넷플릭스를 통해 거세진 한류에 도취돼 있는 동안 우리 문화콘텐츠 생태계는 이렇게 무너지고 있었다. 드라마와 영화에 이어 공연계에까지 '도미노 부실'이 이어지고 있다.
'멸종 위기' 영화관들이 극장 개봉작을 3개월 후 OTT에서 공개하는 홀드백(의무상영기간 제도)을 2년 전부터 주장해왔지만 무용지물이다. 한국 규제에서 자유로운 미국 플랫폼 공룡 넷플릭스와 디즈니플러스가 비협조적이다.
기약 없는 홀드백을 기다리고 있는 동안 한류는 신기루처럼 사라질 수 있다. 드라마도 넷플릭스의 간택에만 목을 맨다면 도태 수순을 밟게 된다. 한류가 세계 주류라는 착각에서 깨어나 밑바닥에서 '리셋'해야 한다. 2020년 '기생충' 이후 아카데미 후보에 오른 한국 장편 영화가 없다. 일본과 동남아시아, 남미에서 꾸준한 인기를 끌 뿐 북미와 유럽시장에선 여전히 비주류다.
넷플릭스가 한국 영화를 외면하는 이 시점이 오히려 극장 영화의 본질로 돌아갈 기회다. 대형 스크린에서 진가를 발휘할 영상과 사운드로 무장한 '극장에서 봐야 하는 영화'를 제작해야 한다. 그래야 해외에 팽배한 '한국 영화는 OTT용'이라는 편견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2006년 스크린쿼터(한국 영화 의무상영일수)를 146일에서 73일로 줄인 이후 우리 영화의 경쟁력이 오히려 높아진 것처럼 전화위복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
드라마도 공멸 위기에서 벗어나려면 넷플릭스와 한류 스타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 넷플릭스 취향에 맞춰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드라마들이 반복되면서 식상해졌다. 다양한 콘텐츠 실험으로 해외 플랫폼 거래 범위를 넓혀야 한다.
광고·협찬이 보장된 한류 스타 캐스팅에 매달리지 말고 새로운 배우 발굴에 적극 나서야 한다. 배우 변우석을 대세로 만든 드라마 '선재 업고 튀어'가 좋은 선례다. 배우 유명세만 좇지 않고 차별화된 작품을 만드는 데 집중한다면 출연료 거품은 언젠가 꺼질 것으로 기대된다.
[전지현 문화스포츠부장]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화제의 뉴스
오늘의 이슈픽
인기 영상
가장 많이 본 뉴스
- 1[생생한 주식쇼 생쇼] 옵션 만기일 변수 속 슈어소...
- 2[CEO인사이트] 젠슨 황의 양자컴퓨팅 '빅 픽처'...
- 3[집중취재] '최대어도 와르르'…싸늘하게 식은 IP...
- 4[생생한 주식쇼 생쇼] 방산·조선 강세…한화시스템(...
- 5[생생한 주식쇼 생쇼] 반도체·정책주 강세…와이씨 ...
- 6[생생한 주식쇼 생쇼] 국내 정책 모멘텀 주목…어보...
- 7[생생한 주식쇼 생쇼] MBN 월드 노광민 매니저 ...
- 8[생생한 주식쇼 생쇼] MBN 월드 김태윤 매니저 ...
- 9[생생한 주식쇼 생쇼] MBN 월드 김동호 매니저 ...
- 10[생생한 주식쇼 생쇼] 우주항공 섹터 주목…제노코 ...
투데이 포커스
화제의 뉴스
포토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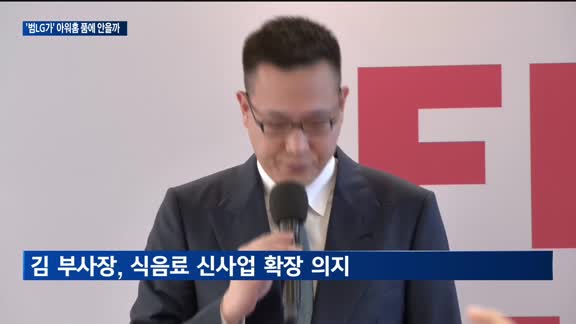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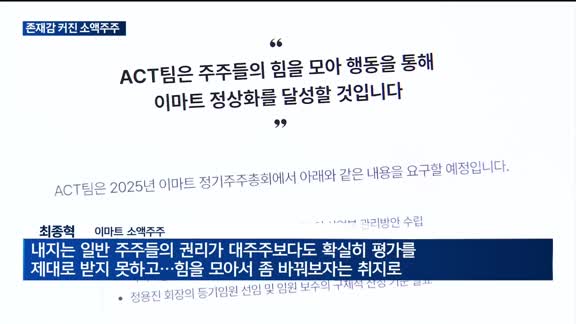
![[경제 토크쇼 '픽'] 삼성도 뛰어든 가전 구독 전쟁…'100조 시장' 구독경제의 세계](https://imgmmw.mbn.co.kr/storage/news/2025/02/13/9237985c66346a5c23625589b52037b2.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