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윤중식 ‘고향’(1979). 현대화랑 |
한국 근현대 미술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온 이들 4인의 작품이 ‘한국 구상회화 4인전 : 윤중식, 박고석, 임직순, 이대원’을 통해 오는 2월 23일까지 서울 종로구 현대화랑에서 관객과 만난다. 이번 전시에는 네 작가가 가장 왕성하게 활동했던 시기인 1970~1980년대 주요 작품들을 조명한다.
평양에서 태어난 윤중식(전 홍익대 미대 교수)은 1939년 일본 제국미술학교 서양화과를 졸업했다. 해방 후 제2회 국전에서 특선을 수상하면서 활동을 시작했다. 강렬한 색채와 굵은 윤곽선, 중후한 톤이 돋보이는 윤중식의 회화는 6.25 전쟁과 분단의 비극 속에서 겪었던 실향민으로서의 그리움과 상실감이 근간을 이룬다.
대동강, 비둘기, 석양, 농촌 풍경 등 어린 시절의 기억을 소재로 한 그의 작품은 깊은 향수를 조형적으로 기록한 예술로 평가받는다. 작가는 성북구립미술관에서 ‘상수(上壽·100세)’전을 개최하는 등 작고 직전까지도 붓을 놓지 않고 그림에 몰두하면서 창작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보였다. 작고 후 가족들은 그의 작품 수십 점을 기증했다.
 |
| 박고석 ‘외설악’(1984). 현대화랑 |
1968년부터는 산행을 통해 그의 작업에서 주된 모티브인 자연을 본격적으로 그리기 시작했다. 북한산, 설악산, 백양산, 지리산 등을 여행하며 사계절을 화폭에 담아냈던 작가는 강렬한 색채 대비와 힘찬 필치로 한국의 명산이 내뿜는 강렬한 기운을 전했다.
특히 1970~1980년대에는 원근법을 무시한 공간 구성과 두터운 유화물감의 질감으로 산의 웅장함과 생명력을 표현하면서 그만의 독특한 예술세계를 확립해나갔다. 이번 전시작 ‘마등령’(1975), ‘외설악’(1984) 등이 대표적이다. 청산유수를 표현한 동양의 전통 산수화를 떠올리게 하면서도 굵직한 선을 강조한 붓질은 고요한 무릉도원보다는 대자연의 힘을 보여 준다.
충북 충주에서 태어난 임직순(전 조선대 미대 교수) 역시 1936년 일본으로 건너가 도쿄의 일본미술학교에서 공부하면서 회화 작업의 기초를 다졌다. 귀국 후 활발한 활동을 이어간 그는 1957년 제6회 국전에서 ‘좌상’으로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임직순의 풍경화는 색채 안에 빛의 개념을 더해 심미적 경험을 확장하는 한편, 깊은 내면 세계를 구현한 작품으로 평가받는다. 특히 자연 현장에서 받은 감동을 현실감 있게 그려내면서도 그 아름다움을 정감 있게 표현했다.
 |
| 임직순의 1970년대 작품 ‘책 읽는 소녀’. 현대화랑 |
경기 문산 출신인 이대원(전 홍익대 총장)은 이번 4인전 작가 가운데 유일하게 정규 미술교육을 받지 않은 작가다. 서울대 전신인 경성제국대 법학과를 졸업했지만 조선미술전람회, 국전에 입선하며 두각을 드러냈다. 1950~1960년대 모노크롬, 미니멀리즘 경향이 주를 이루던 한국 화단에서 이대원은 한국의 산과 들, 나무, 연못, 돌담, 과수원 등 친숙한 자연을 주요 소재로 택하며 자신만의 독창적인 예술세계를 펼쳤다. 그는 1957~1958년 독일에서 세 차례 전시를 열며 한국 미술을 해외에 알리기도 했다.
풍부한 원색과 짧고 연속적인 붓 터치로 형태와 윤곽을 그리는 독자적인 방식에 매진했던 이대원은 봄, 여름, 가을, 겨울 다른 색채로 물들어가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표현했다. 그러면서도 삶의 즐거움을 화폭에 담아내 감각적이고 밝은 에너지가 넘치는 회화적 경험을 전했다. 낙엽이 흐드러지는 단풍나무 아래서 산을 올려다 보듯 그린 전시작 ‘북악산’(1976)에서는 가을의 풍요로움이 느껴진다.
근래 윤중식·박고석·임직순·이대원의 작품을 다수 모은 전시는 드물었다. 박명자 현대화랑 회장은 “1970년 문을 연 화랑으로 저평가된 근대미술 작가를 재조명해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전시를 열었다”며 “과거 없이 현대가 없듯이 근대미술 가치를 재정립하는 국립근대미술관을 설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 이대원 ‘북악산’(1976). 현대화랑 |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화제의 뉴스
오늘의 이슈픽
인기 영상
가장 많이 본 뉴스
- 1[CEO인사이트] 젠슨 황의 양자컴퓨팅 '빅 픽처'...
- 2[집중취재] '최대어도 와르르'…싸늘하게 식은 IP...
- 3[생생한 주식쇼 생쇼] 방산·조선 강세…한화시스템(...
- 4[생생한 주식쇼 생쇼] MBN 월드 김태윤 매니저 ...
- 5[생생한 주식쇼 생쇼] MBN 월드 노광민 매니저 ...
- 6[생생한 주식쇼 생쇼] MBN 월드 김동호 매니저 ...
- 7[CEO인사이트] 화제의 '양자컴퓨터', 기후변화 ...
- 8[생생한 주식쇼 생쇼] MBN 월드 이창호 매니저 ...
- 9[매일경제TV 극찬기업] 뉴트리케어·에이치에너지·한...
- 10디지털화에 비용 효율성까지…1분기에만 은행점포 77...
투데이 포커스
화제의 뉴스
포토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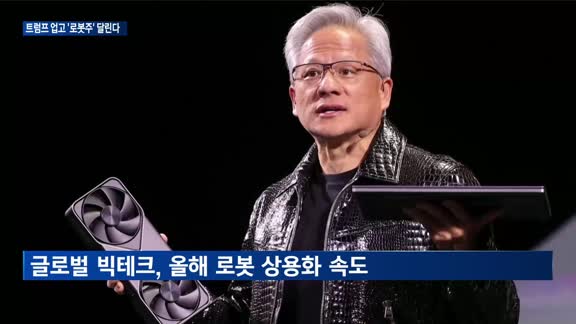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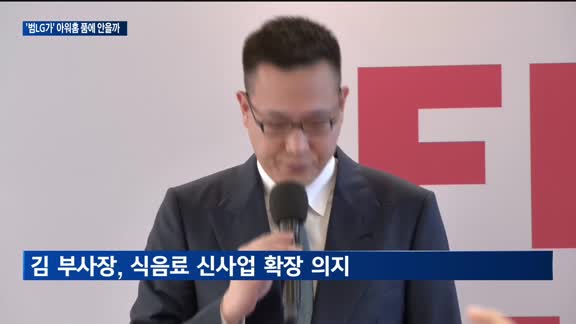


![[집중취재] '최대어도 와르르'…싸늘하게 식은 IPO 시장, 이유는?](https://imgmm.mbn.co.kr/vod/news/103/2025/02/12/20250212090820_10_103_0_MM1005466628_4_221.jpg)


![[매일경제TV 극찬기업] 뉴트리케어·에이치에너지·한미하이텍](https://imgmmw.mbn.co.kr/storage/news/2025/02/12/61d61a0f9a9bcde9bb0f451a41ea6506.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