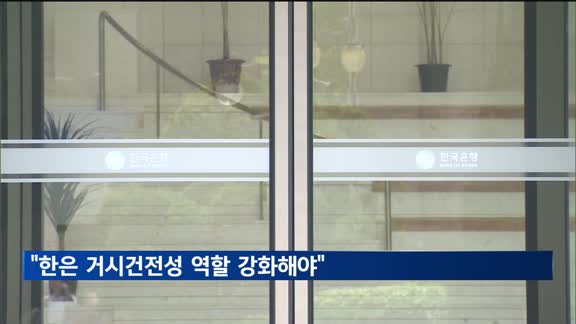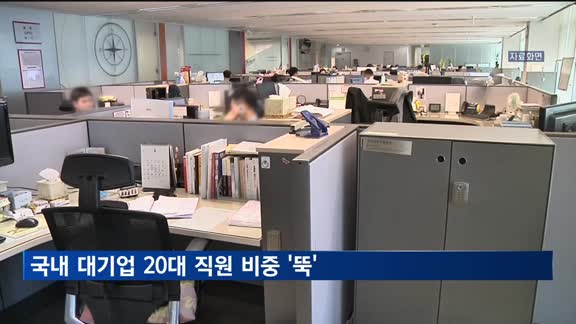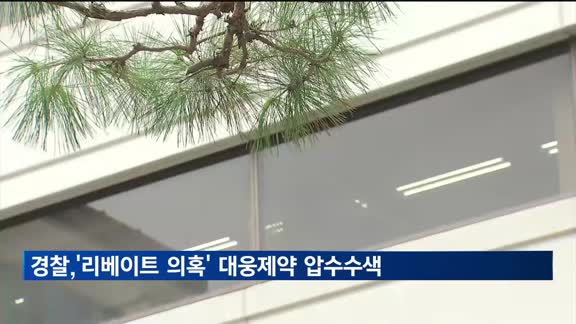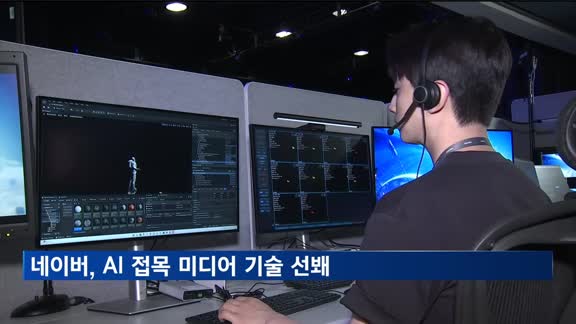|
"언제 쫓겨날지 모릅니다. 생활이 무너져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
A씨의 삶은 8년 전 분양·신탁 전세사기를 당하면서 완전히 달라졌다. 전 재산을 털어 새 보금자리로 빌라를 마련했지만 건축주는 준공 전이라는 이유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미루고 빌라를 담보로 신탁사 대출까지 받았다. 고육지책으로 전세 계약으로 바꿔 보증금이라도 지키려 했지만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고 쫓겨날 처지에 놓였다.
피해 유형은 조금씩 다르지만 정부가 파악한 전세사기 피해자만 3만명이 넘는다. 정부가 허술한 세입자 보호 시스템을 방치하는 사이 전세사기는 법과 제도의 빈틈을 파고들었다.
최근 여당이 전세사기 피해 구제를 위한 배드뱅크안을 꺼냈다. 이미 개정한 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후속 조치다. 2023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피해 주택을 사들일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지만 실제 매입 건수는 1043건에 그쳤다. 부실채권 전문기관이 아닌 LH가 개별 건을 사들이기에는 역부족이어서 부실채권을 매입해 권리관계를 정리하는 배드뱅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금융당국 주도로 피해 주택에 설정된 선순위 담보채권 현황에 대한 전수조사부터 시작한다고 한다. 그동안 실태조사도 이뤄지지 않았지만 새 정부에서는 더는 손 놓고 있을 수 없다는 분위기가 강하다.
여당은 전세사기 배드뱅크 사업 규모를 1조원 수준으로 추산한다. 전세사기 중에서도 소액 임차인이 아니면서 선순위 채권이 있는 피해자가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는데, 이들의 선순위 채권액에 매입가 할인율을 적용해 산출한 금액이다. 1조원에 달하는 재원을 마련할 방안이나 구제 범위와 대상 등은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다.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벼랑 끝에 선 사기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도록 정부와 금융권이 머리를 맞대야 할 때다. 공적 자금 구제에 따르기 마련인 형평성과 재원 조달 논란도 해결해야 할 숙제다. 실수요자들 삶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전세사기에 대해서 '사후 구제'라는 지적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전세 계약 구조 개선, 사기범 엄벌 등 근본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
[김혜란 금융부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화제의 뉴스
오늘의 이슈픽
인기 영상
가장 많이 본 뉴스
- 1K-방산주, 조정 후 반등…하반기 날아오를까
- 2가상화폐 3개 법안 미 하원 통과…'엑스알피' 최고...
- 3[집중취재] 한미 관세협상 본게임…막판 '조율 진통...
- 4"SK하이닉스 2026년 HBM 물량 확정까지는 노...
- 5"피해 금액 전액 보상"…SGI서울보증, 시스템 장...
- 6증시 오늘 '핫이슈'…"MSCI 8월 정기변경 심사...
- 7[경제토크쇼픽] 이창영 “지방은행 개념 ‘지역은행’...
- 8한미 관세협상 막판 조율…미국 '3대 요구'에 고심
- 9[CEO인사이트] 경제토크쇼픽 비하인드 - 차이나머...
- 10이재용 회장 대법원 선고 앞두고…삼성, 긴장 속 침...
투데이 포커스
화제의 뉴스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