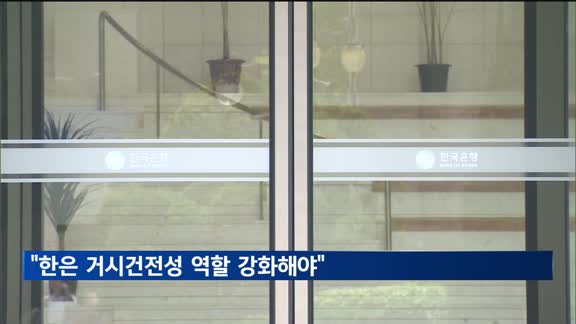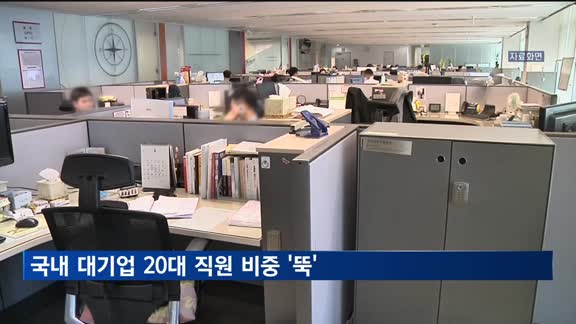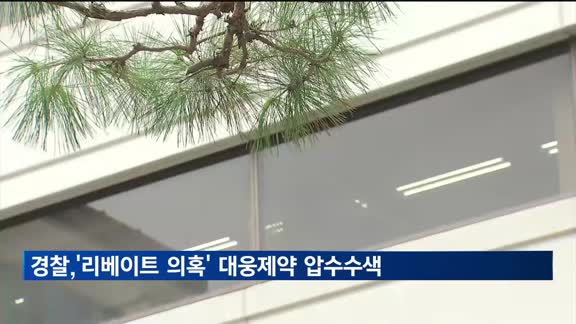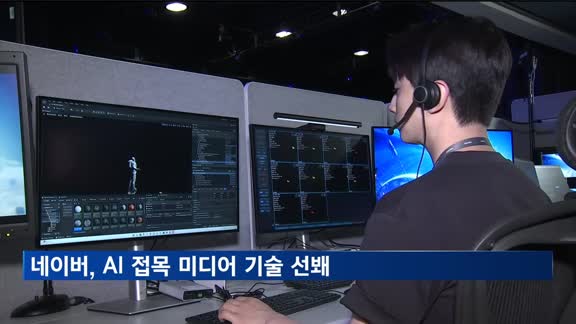◆ 보이스피싱 20년 잔혹사 ◆
19년1개월. 국내에서 처음 보이스피싱 신고가 접수된 뒤 흐른 시간이다. 그동안 정부는 140여 번의 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범죄 수법은 대책을 비웃듯 진화했고, 피해 규모도 줄어들기는커녕 매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하지만 피해 구제책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심지어 정부가 18년 전 뿌리 뽑겠다고 했던 대포통장·대포폰은 아직도 보이스피싱 범죄 현장 곳곳에서 활용되고 있다.
13일 매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보이스피싱 범죄가 횡행하기 시작한 2006년부터 올해까지 관련 부처의 대응책 발표는 총 143건으로 집계됐다. 부처별로 살펴보면 금융위원회가 36건, 경찰청이 35건, 방송통신위원회가 28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7건의 대응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보이스피싱 대응책에서 범죄 수법에 대한 규제 강화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잇달아 내놨다. 세부적으로는 △방송통신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통신당국은 유선상 사칭 방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은 비대면 이체·대출 규제와 피해액 보상 강화 △경찰 등 수사당국은 민간 기업과의 공조를 통한 수사력 강화 등을 약속했다.
정부의 보이스피싱 첫 대책은 200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국무조정실은 경찰·과기정통부(당시 정보통신부)·국토교통부와 공동으로 대포통장·대포폰 등 불법 명의 물건을 뿌리 뽑겠다며 '대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하지만 이 대책은 수년간 이행되지 않았고, 그사이 대포폰을 악용한 사기 피해는 폭증했다. 대포폰 대출사기 피해 건수는 2006년 132건에서 2011년 2357건으로 20배 가까이 늘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대포통장·대포폰만 22만4515개에 달하는 등 대책 발표 후 약 1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전히 보이스피싱의 주요 범행 수단으로 쓰이고 있다. 지난해 알뜰통신사 한 곳에서 외국인 명의 대포폰이 약 7만건 개통된 게 단적인 사례다. 외국인 명의 대포폰이 한 해에 7만건 이상 적발된 것은 작년이 처음이다. 그러나 과기정통부는 어느 업체에서 문제가 생겼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단기간에 외국인 명의 회선이 급증한 경우에 대한 사후 점검조차 실시하지 않았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가장 대표적 유형인 '사칭 사기'도 정부의 각종 대책을 비웃듯 20년째 피해자들을 울리고 있다. 2007년 과기정통부가 발신자번호표시 조작 처벌을 강화하는 등 '전화 금융사기'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후에도 경찰과 공동으로 사칭 전화 여부를 확인하고 음성으로 사기 위험 경고를 보내는 등의 대책 도입을 예고했으나 번번이 '기술적 한계'를 이유로 실제 도입으로 이어진 적은 없었다. 그 결과 사칭 사기는 2006년 6월 첫 피해가 접수된 이후 지금까지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통화와 문자를 통한 무분별한 피싱 시도인 일명 '스팸 폭탄' 역시 10여 년째 고질병처럼 국민을 괴롭히고 있다. 방통위는 2012년 '피싱 대응반'을 구성하고 통신사에 피싱 차단을 위한 기술적 조치 의무를 부여하겠다고 발표한 것을 시작으로 △발신번호 변작 전화·문자 차단(2015년) △불법 대출 스팸 단속(2021년) △불법 스팸 방지 종합대책(2024년) 등 수차례 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스팸 발송 업체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다. 방통위에 따르면 2023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불법 스팸 발송으로 적발된 73개에 대한 처벌은 평균 458만원의 과태료에 불과했다. 이에 스팸 신고 건수가 2023년 3억1686만건, 지난해 3억8632만건으로 2년 연속으로 3억건을 넘기는 등 불법 스팸은 여전히 무차별적으로 유포되고 있다.
피해자의 금전 손실로 직결되는 비대면 대출에 대한 규제도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특히 카드론은 별도 심사 서류 없이도 휴대전화 본인 인증 등 간략한 절차만 거치면 즉시 고액을 대출할 수 있어 수년째 보이스피싱 조직의 주요 금전 탈취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이 같은 피해를 막고자 금융위는 2011년부터 카드론 대출 실행 절차와 금융기관의 피해 보상 의무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으나 비대면 대출은 지금까지도 피싱 조직의 대표적인 금전 탈취 경로로 남아 있다. 주요 규제 대상이어야 할 신용카드사·대부 업체 등은 계좌를 발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적용을 받지 않아서다.
범죄 수사를 위한 민관 공조 체계 구축도 지지부진하다. 경찰, 금감원, 방통위, 과기정통부 등은 2009년부터 이동통신사와 금융기관 등에 사기 예방과 수사 협조 의무를 부여하겠다고 밝혔으나 입법 미비로 현장 경찰 사이에선 그 실효성을 체감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신고하더라도 기업이 보안을 명목으로 협조를 꺼리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김송현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19년1개월. 국내에서 처음 보이스피싱 신고가 접수된 뒤 흐른 시간이다. 그동안 정부는 140여 번의 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범죄 수법은 대책을 비웃듯 진화했고, 피해 규모도 줄어들기는커녕 매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하지만 피해 구제책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심지어 정부가 18년 전 뿌리 뽑겠다고 했던 대포통장·대포폰은 아직도 보이스피싱 범죄 현장 곳곳에서 활용되고 있다.
13일 매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보이스피싱 범죄가 횡행하기 시작한 2006년부터 올해까지 관련 부처의 대응책 발표는 총 143건으로 집계됐다. 부처별로 살펴보면 금융위원회가 36건, 경찰청이 35건, 방송통신위원회가 28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7건의 대응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보이스피싱 대응책에서 범죄 수법에 대한 규제 강화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잇달아 내놨다. 세부적으로는 △방송통신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통신당국은 유선상 사칭 방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은 비대면 이체·대출 규제와 피해액 보상 강화 △경찰 등 수사당국은 민간 기업과의 공조를 통한 수사력 강화 등을 약속했다.
정부의 보이스피싱 첫 대책은 200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국무조정실은 경찰·과기정통부(당시 정보통신부)·국토교통부와 공동으로 대포통장·대포폰 등 불법 명의 물건을 뿌리 뽑겠다며 '대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하지만 이 대책은 수년간 이행되지 않았고, 그사이 대포폰을 악용한 사기 피해는 폭증했다. 대포폰 대출사기 피해 건수는 2006년 132건에서 2011년 2357건으로 20배 가까이 늘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대포통장·대포폰만 22만4515개에 달하는 등 대책 발표 후 약 1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전히 보이스피싱의 주요 범행 수단으로 쓰이고 있다. 지난해 알뜰통신사 한 곳에서 외국인 명의 대포폰이 약 7만건 개통된 게 단적인 사례다. 외국인 명의 대포폰이 한 해에 7만건 이상 적발된 것은 작년이 처음이다. 그러나 과기정통부는 어느 업체에서 문제가 생겼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단기간에 외국인 명의 회선이 급증한 경우에 대한 사후 점검조차 실시하지 않았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가장 대표적 유형인 '사칭 사기'도 정부의 각종 대책을 비웃듯 20년째 피해자들을 울리고 있다. 2007년 과기정통부가 발신자번호표시 조작 처벌을 강화하는 등 '전화 금융사기'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후에도 경찰과 공동으로 사칭 전화 여부를 확인하고 음성으로 사기 위험 경고를 보내는 등의 대책 도입을 예고했으나 번번이 '기술적 한계'를 이유로 실제 도입으로 이어진 적은 없었다. 그 결과 사칭 사기는 2006년 6월 첫 피해가 접수된 이후 지금까지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통화와 문자를 통한 무분별한 피싱 시도인 일명 '스팸 폭탄' 역시 10여 년째 고질병처럼 국민을 괴롭히고 있다. 방통위는 2012년 '피싱 대응반'을 구성하고 통신사에 피싱 차단을 위한 기술적 조치 의무를 부여하겠다고 발표한 것을 시작으로 △발신번호 변작 전화·문자 차단(2015년) △불법 대출 스팸 단속(2021년) △불법 스팸 방지 종합대책(2024년) 등 수차례 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스팸 발송 업체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다. 방통위에 따르면 2023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불법 스팸 발송으로 적발된 73개에 대한 처벌은 평균 458만원의 과태료에 불과했다. 이에 스팸 신고 건수가 2023년 3억1686만건, 지난해 3억8632만건으로 2년 연속으로 3억건을 넘기는 등 불법 스팸은 여전히 무차별적으로 유포되고 있다.
피해자의 금전 손실로 직결되는 비대면 대출에 대한 규제도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특히 카드론은 별도 심사 서류 없이도 휴대전화 본인 인증 등 간략한 절차만 거치면 즉시 고액을 대출할 수 있어 수년째 보이스피싱 조직의 주요 금전 탈취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이 같은 피해를 막고자 금융위는 2011년부터 카드론 대출 실행 절차와 금융기관의 피해 보상 의무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으나 비대면 대출은 지금까지도 피싱 조직의 대표적인 금전 탈취 경로로 남아 있다. 주요 규제 대상이어야 할 신용카드사·대부 업체 등은 계좌를 발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적용을 받지 않아서다.
범죄 수사를 위한 민관 공조 체계 구축도 지지부진하다. 경찰, 금감원, 방통위, 과기정통부 등은 2009년부터 이동통신사와 금융기관 등에 사기 예방과 수사 협조 의무를 부여하겠다고 밝혔으나 입법 미비로 현장 경찰 사이에선 그 실효성을 체감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신고하더라도 기업이 보안을 명목으로 협조를 꺼리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김송현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화제의 뉴스
오늘의 이슈픽
인기 영상
가장 많이 본 뉴스
- 1K-방산주, 조정 후 반등…하반기 날아오를까
- 2[집중취재] 한미 관세협상 본게임…막판 '조율 진통...
- 3가상화폐 3개 법안 미 하원 통과…'엑스알피' 최고...
- 4"SK하이닉스 2026년 HBM 물량 확정까지는 노...
- 5"피해 금액 전액 보상"…SGI서울보증, 시스템 장...
- 6증시 오늘 '핫이슈'…"MSCI 8월 정기변경 심사...
- 7[경제토크쇼픽] 이창영 “지방은행 개념 ‘지역은행’...
- 8한미 관세협상 막판 조율…미국 '3대 요구'에 고심
- 9[CEO인사이트] 경제토크쇼픽 비하인드 - 차이나머...
- 10이재용 회장 대법원 선고 앞두고…삼성, 긴장 속 침...
투데이 포커스
화제의 뉴스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