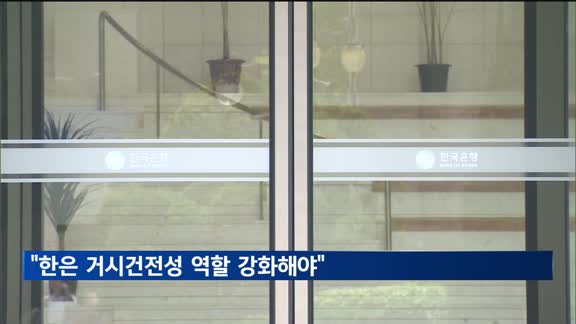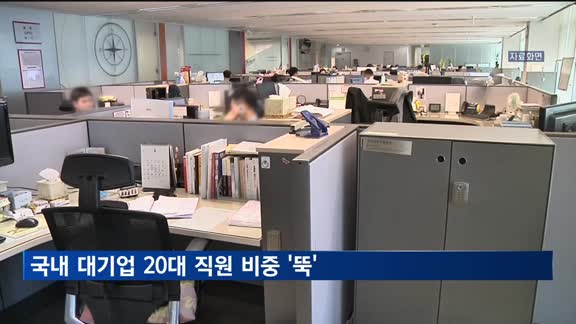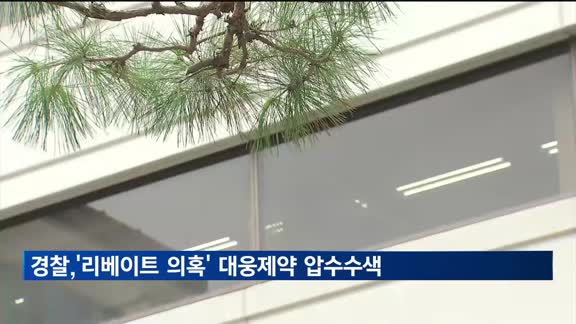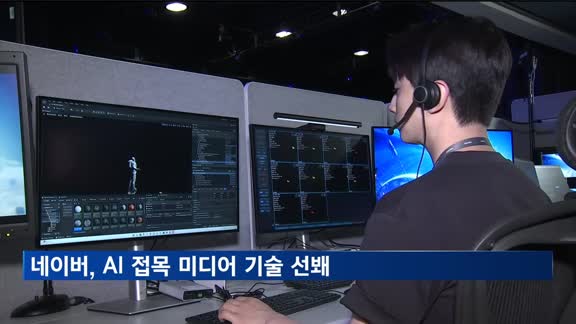|
국내 대학가가 인재 유출로 시름하는 가운데 서울대 등 일부 대학에서 교수들의 성과에 따라 연봉을 차등 지급하는 성과연봉제가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장기간 등록금 동결 여파로 대학이 재정난에 직면해 있어 파격 인센티브 제공은 어려운 실정이다. 이 때문에 성과연봉제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심지어 대부분의 대학은 성과연봉제 도입은커녕 호봉제를 통해 교수들의 장기 근무를 간신히 유도하는 실정이다.
9일 서울대는 정년 보장 교수들을 대상으로 한 성과연봉제 운용 지침에 대한 의견 조회 공문을 지난주 발송했다고 밝혔다. 해당 지침은 정교수와 일부 부교수 등 1400여 명의 성과를 4개 등급으로 나눠 평가한 후 등급에 따라 성과급을 차등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대의 성과연봉제 도입 배경에는 인재 유출에 대한 위기감이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4년간 서울대에서 해외 대학으로 옮긴 교수는 56명으로 지난해 서울대 전체 교원(2344명)의 2%에 달한다. 한 서울대 교수는 "연구 환경은 논외로 해도 해외 대학에 비해 급여 격차가 너무 크다"며 "지금 여건으로는 우수 인력 유출을 막기 힘들다"고 말했다.
현재 주요 대학들은 재정 압박에 성과연봉제 도입은 꿈도 꾸지 못한 채 근속연수로 임금을 결정하는 호봉제를 유지하고 있다. 실제 고려대, 연세대, 성균관대, 서강대 등 서울 시내 주요 대학 대다수는 호봉제를 시행 중이다. 정부 규제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16년간 대부분 대학 등록금이 동결되며 급여 부담이 큰 성과연봉제 대신 호봉제가 선호되는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대 역시 재정 압박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 때문에 성과연봉제를 도입해도 '박봉'은 여전할 수밖에 없다는 근본적 한계에 봉착해 있다. 서울대 관계자는 "성과연봉제를 정착시키기 위한 재정 확보가 난관"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한계에도 성과연봉제는 교수들의 연구 의욕을 일정 부분 끌어올리는 효과를 지닌 것으로 보인다. 중앙대는 성과연봉제가 적용된 첫해인 2010년부터 2022년까지 12년 만에 국제논문 발행 건수와 국제학술지 피인용 수치가 각각 2.5배, 3.7배 늘어났다.
[김송현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화제의 뉴스
오늘의 이슈픽
인기 영상
가장 많이 본 뉴스
- 1K-방산주, 조정 후 반등…하반기 날아오를까
- 2[집중취재] 한미 관세협상 본게임…막판 '조율 진통...
- 3가상화폐 3개 법안 미 하원 통과…'엑스알피' 최고...
- 4"SK하이닉스 2026년 HBM 물량 확정까지는 노...
- 5"피해 금액 전액 보상"…SGI서울보증, 시스템 장...
- 6증시 오늘 '핫이슈'…"MSCI 8월 정기변경 심사...
- 7[경제토크쇼픽] 이창영 “지방은행 개념 ‘지역은행’...
- 8한미 관세협상 막판 조율…미국 '3대 요구'에 고심
- 9[CEO인사이트] 경제토크쇼픽 비하인드 - 차이나머...
- 10이재용 회장 대법원 선고 앞두고…삼성, 긴장 속 침...
투데이 포커스
화제의 뉴스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