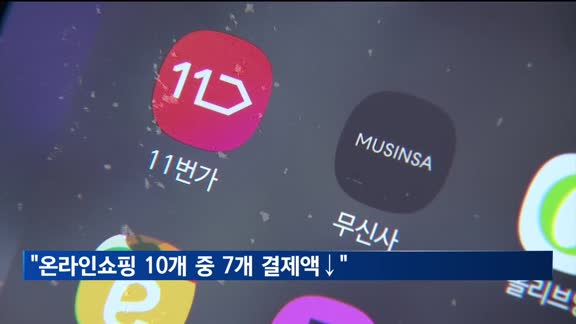|
|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지난 21일 매일경제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한국의 과도한 상속세를 중국의 자본 침식과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으로 뽑았다.
최 교수는 “상속세가 너무 많다며 기업 오너가 지분을 중국 자본에 양도하는 사례가 너무 많다”며 “국내 증시 부양의 가장 큰 걸림돌 역시 상속 부담으로 지배주주가 주가 상승을 꺼린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최 교수는 상속세 부담을 줄이면서 경영권을 유지하도록 하는 독일식 공익법인 활성화를 해결책으로 꼽았다.
독일의 대기업은 폭스바겐재단·로베르트-보쉬재단 등의 ‘기업재단(Unternehmensstiftung)’을 통해 창업자 가문의 지배력을 유지하고, 중견·중소기업은 ‘가족재단(Familienstiftung)’이 기업을 관리하는 형태다.
특히 그는 중견·중소기업의 경우 종중과 유사한 형태의 가족재단이 해법이 될 것으로 봤다.
최 교수는 “가족재단은 오너가의 지분을 모두 재단에 모아두고 배당금을 가족들이 나눠 가지는 방식”이라며 “가족회의를 통해 기업 경영권을 가질 사람을 정하거나 전문경영인을 선정해 기업 해체를 막는다”고 말했다.
삼성재단이나 정몽구재단과 비슷한 기업재단의 경우 재단을 통해 승계를 보장하는 대신 적극적인 사회공헌 사업을 펼쳐야 한다.
보쉬사 지분 92%를 소유한 로버트 보쉬 재단은 이익배당권을 행사해 창업자 후손들에게 나누면서도 배당 수익 일부를 정관에서 정한 공익목적 달성을 위해 사용한다.
최 교수는 “기업재단마다 군 복무 여부나 경영 경력 등으로 점수를 매겨 가족 중 이사장을 뽑는다”며 “연구를 통해 전문경영인보다 가족 회사의 성과가 낫다는 게 증명된 상태”라고 말했다.
최 교수는 공익법인 활성화와 함께 자본이득세 도입을 ‘투 트랙’으로 진행해야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상속세 대신 상속재산을 처분하는 시점에 세금이 부과되는 자본이득세를 도입해 기업 승계 부담을 줄여야한다는 것이다.
자본이득세를 도입하면 승계가 이뤄지더라도 지분을 매각하지 않으면 세금이 부과되지 않아 지배주주가 주가 상승을 꺼릴 이유가 없고, 중국 자본에 기업 소유권을 넘길 유인이 줄어든다.
지난 16일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상속세 완화와 유산 취득세·자본 이득세의 필요성을 시사한 바 있다.
최 교수는 “자본 이득세 체제로 바뀌면 최소한 최대 주주가 주가를 떨어뜨릴 이유는 줄어들 수 있다”이라며 “재단을 통한 승계와 자본 이득세 도입 양쪽이 이뤄지면 효과가 극대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화제의 뉴스
오늘의 이슈픽
인기 영상
가장 많이 본 뉴스
- 1의정부 용현동 화재…소방당국 진화중
- 2[단독] '총파업 투표' KB국민은행, 오늘 오후 ...
- 3주담대 변동금리 또 내린다…코픽스 3개월 연속 하락
- 4[집중취재] CES 2025 성황리 폐막…AI·로봇...
- 5임시공휴일 27일 확정…'설 황금연휴' 지역관광 마...
- 6[집중취재] 'K편의점 전성시대'…"백화점 꺾고 해...
- 7[생생한 주식쇼 생쇼] 외국인 매도 대응 및 원전·...
- 8[CEO인사이트] 올해도 화두는 'AI'…CES 2...
- 9강달러에도 오르는 금 값…"연내 온스당 3천달러 도...
- 10코스피·코스닥 합친 'KRX TMI' 공개…"코스닥...
투데이 포커스
화제의 뉴스
포토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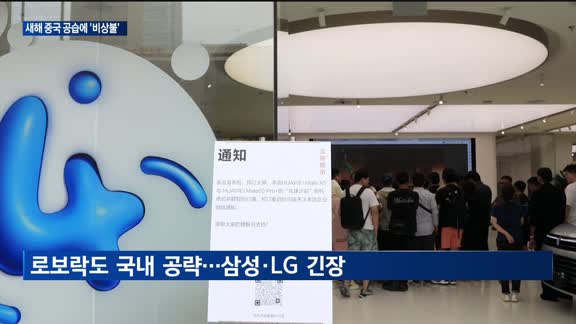


![[집중취재] 'K편의점 전성시대'…"백화점 꺾고 해외서도 명성 넓힌다"](https://imgmm.mbn.co.kr/vod/news/103/2025/01/14/20250114163851_10_103_0_MM1005443607_4_244.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