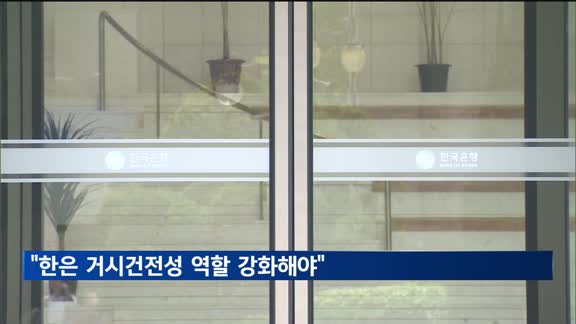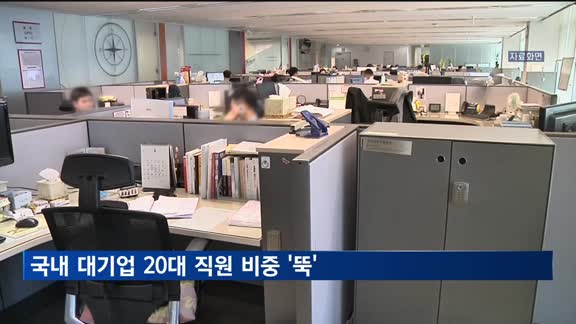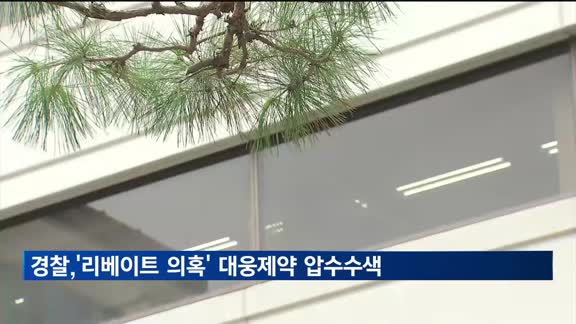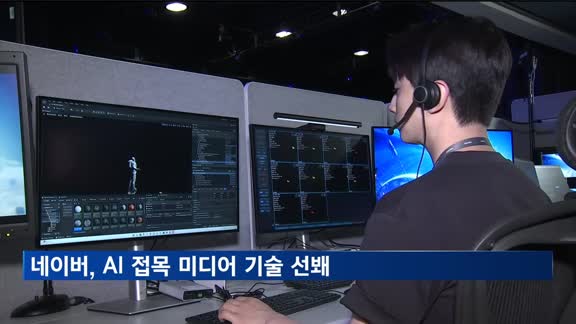|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조선 부흥'을 국정 과제로 내걸었다. 그러나 미국 조선소는 인력과 설비 모두에 구조적 공백이 크다. 반면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생산성을 보유했지만 과잉 설비와 '중국 리스크'에 묶여 있다. 두 나라가 손을 잡으면 '미국 우선·동맹 공동 승리'라는 정치·경제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
첫째, 분업형 공동 생산을 시작해야 한다. 울산·거제에서 고부가 모듈·엔진·내장재를 만들고, 필라델피아·걸프코스트에서 블록 조립과 시운전을 하면 존스법의 '미국 건조(US-built)'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미국은 고임금 일자리를, 한국은 달러 매출과 공급망 다변화를 얻는다. 최근 한화오션이 인수한 필리(Philly) 조선소는 이 모델의 실효성을 입증하는 실험실이자 전진기지다.
둘째, 액화천연가스(LNG)·친환경 선박 동맹을 맺어야 한다. 셰일가스 수출을 뒷받침할 17만㎥급 LNG 운반선, 부유식 저장·재기화 설비(FSRU), 액화 이산화탄소(CO2) 운반선은 미 의회의 탄소저감 로드맵과 직결된다. 특히 CO2 운반선은 e연료 원료 수송과 해저 저장을 동시에 지원한다. 한국의 축적된 건조 경험과 미국의 에너지 패권이 만나면 '녹색 해운'의 국제표준을 주도할 수 있다.
셋째, 해양안보 협력을 가속해야 한다. 미 해군은 2042년까지 381척의 유인 전투함 확보를 제시했지만 독자적 달성은 쉽지 않다. 한국의 호위함, 무인수상정(USV), 쇄빙선 및 극지 운항 LNG선 건조 노하우를 투입해 공동 생산하면 미국은 중국을 억제하며 예산을 절감하고 한국은 방산 선종과 수출시장을 넓힌다.
넷째, 스마트·로봇 야드를 미국에 이식해야 한다. 한국형 인공지능(AI) 설계, 로봇 용접, 디지털 트윈 기술을 휴스턴·빌럭시의 노후 야드에 적용하면 한 세대 만에 생산성을 30% 이상 끌어올릴 수 있다. 현장 데이터를 클라우드에 모아 병목을 실시간으로 제거하는 '데이터 레이크'도 함께 이전해야 한다. 공동 개발한 AI 설계 소프트웨어(SW)를 특허로 확보하면 글로벌 규격 선점과 지식재산권(IP) 보호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
다섯째, 정부 간 패키지 지원이 필수적이다. 한미 태스크포스를 100일 내 가동해 관세 면제,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 사전 심사, 10억달러 규모의 해양안보 펀드를 동시에 실행해야 한다. 한국수출입은행(K-EXIM)과 미국수출입은행(EXIM)이 공동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국방생산법(DPA) 자금이 스마트 야드 설비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K해양 가치사슬' 사절단이 현지 공급망을 조직하고, '스마트 조선 아카데미'가 3년간 5000명의 전문인력을 양성하면 미국 노동조합은 일자리 창출을, 양국 기업은 인력난 해소를 보장받게 된다.
지금은 한국 조선이 기술 우위를 동맹 가치로 환전할 결정적 기회다. '파트너십'이라는 사다리로 보호주의를 넘어 중국 메가조선소의 압박을 돌파하고, 미국은 해군·상선 수요를 안정적으로 충족할 수 있다. 부산에서 모빌(미국 걸프 해양 허브)까지 자유 해양을 함께 건조하자. 정부와 산업계의 즉각적 행동을 촉구한다.
[김태완 서울대 조선해양공학과 교수]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화제의 뉴스
오늘의 이슈픽
인기 영상
가장 많이 본 뉴스
- 1K-방산주, 조정 후 반등…하반기 날아오를까
- 2"피해 금액 전액 보상"…SGI서울보증, 시스템 장...
- 3증시 오늘 '핫이슈'…"MSCI 8월 정기변경 심사...
- 4[집중취재] 한미 관세협상 본게임…막판 '조율 진통...
- 5한미 관세협상 막판 조율…미국 '3대 요구'에 고심
- 6<경제토크쇼픽> 이창영 “지방은행 개념 ‘지역은행’...
- 7이재용 회장 대법원 선고 앞두고…삼성, 긴장 속 침...
- 8'디지털 역전'은 가능한가…지방은행의 반격 시나리오
- 9[CEO인사이트] 경제토크쇼픽 비하인드 - 차이나머...
- 10엔지더블유, 늘푸른농장과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
투데이 포커스
화제의 뉴스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