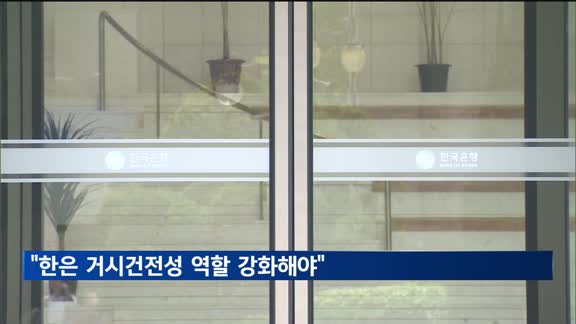구글이 최근 미국의 핵융합 스타트업 'TAE 테크놀로지스'에 1억5000만달러를 추가 투자했다. 2015년부터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핵융합 연구를 함께해온 회사다. 이번에는 더 과감하게 돈을 넣었다. AI 시대, 데이터센터 한 곳이 도시 하나의 전기를 소비하는 세상이다. 전력은 생존의 조건이 됐다. 빅테크 기업들은 원전 재가동, 소형 원전뿐 아니라 핵융합에도 시선을 돌리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핵융합 스타트업 '헬리온 에너지'와 2028년부터 전기를 공급받는 계약을 체결했고, 코먼웰스퓨전시스템은 미국 버지니아에 2030년대 초 핵융합 발전소를 짓겠다고 발표했다. 용지 확보에 시간이 걸리니 이를 먼저 해결하고, 기술 개발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 제프 베이조스, 샘 올트먼 등의 투자를 받은 스타트업들이 앞다퉈 2030년 핵융합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다. 돈이 몰리니 분위기도 달라졌다. 10년 전만 해도 "2030년 핵융합 상용화에 나서겠다"는 기업이 있다면 '유사 과학' 소리를 듣기 딱 좋았는데, 이제는 "될 수도 있겠다"는 기대감이 자리 잡고 있다.
태양을 모방한 핵융합 발전은 '핵분열'을 이용하는 원자력 발전과 비교했을 때 방사성 폐기물도 적고, 안전하며, 많은 전력을 얻을 수 있어 '꿈의 에너지'라는 별명이 따라다닌다. 핵융합 상용화에 성공하면 에너지 걱정은 상당 부분 사라진다.
하지만 이론은 이론일 뿐 쉽지 않다. 미국, 일본, 한국 등 7개국이 기술력을 총동원해 핵융합 상용화 연구를 진행하는 핵융합로(ITER) 건설 프로젝트의 핵융합 점화 시기는 2018년에서 2025년, 2039년으로 계속해서 늦춰졌다. "핵융합 발전은 항상 30년 뒤에 있다"라는 말이 농담처럼 소비됐던 이유다.
2030년까지 5년도 채 남지 않았다. 아직 현장을 뛰는 기자일 때, '인공 태양, 지구에 떴다'라는 기사를 쓸 수 있는 날이 왔으면 한다. 그날은 기사를 아무리 어렵게 써도 다들 이해해줄 거라 믿는다.
[원호섭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마이크로소프트는 핵융합 스타트업 '헬리온 에너지'와 2028년부터 전기를 공급받는 계약을 체결했고, 코먼웰스퓨전시스템은 미국 버지니아에 2030년대 초 핵융합 발전소를 짓겠다고 발표했다. 용지 확보에 시간이 걸리니 이를 먼저 해결하고, 기술 개발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 제프 베이조스, 샘 올트먼 등의 투자를 받은 스타트업들이 앞다퉈 2030년 핵융합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다. 돈이 몰리니 분위기도 달라졌다. 10년 전만 해도 "2030년 핵융합 상용화에 나서겠다"는 기업이 있다면 '유사 과학' 소리를 듣기 딱 좋았는데, 이제는 "될 수도 있겠다"는 기대감이 자리 잡고 있다.
태양을 모방한 핵융합 발전은 '핵분열'을 이용하는 원자력 발전과 비교했을 때 방사성 폐기물도 적고, 안전하며, 많은 전력을 얻을 수 있어 '꿈의 에너지'라는 별명이 따라다닌다. 핵융합 상용화에 성공하면 에너지 걱정은 상당 부분 사라진다.
하지만 이론은 이론일 뿐 쉽지 않다. 미국, 일본, 한국 등 7개국이 기술력을 총동원해 핵융합 상용화 연구를 진행하는 핵융합로(ITER) 건설 프로젝트의 핵융합 점화 시기는 2018년에서 2025년, 2039년으로 계속해서 늦춰졌다. "핵융합 발전은 항상 30년 뒤에 있다"라는 말이 농담처럼 소비됐던 이유다.
2030년까지 5년도 채 남지 않았다. 아직 현장을 뛰는 기자일 때, '인공 태양, 지구에 떴다'라는 기사를 쓸 수 있는 날이 왔으면 한다. 그날은 기사를 아무리 어렵게 써도 다들 이해해줄 거라 믿는다.
[원호섭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화제의 뉴스
오늘의 이슈픽
인기 영상
가장 많이 본 뉴스
- 1홈플러스에서 고려아연까지…MBK의 '책임 없는 흔들...
- 2미국 주식 보관액 183조 원 '역대 최고'…테슬라...
- 3다음 주 도우인시스·뉴로핏 코스닥 상장
- 4트럼프 '지니어스법' 서명…글로벌 가상자산 시총 '...
- 5부산 '르엘 리버파크 센텀' 등 7천956가구 분양
- 6경남 산청 산사태에 국가소방동원령 발령…중대본 "총...
- 7김정관 산업장관, 전력 수급 상황 점검…"안정적 공...
- 8주문 폭주에 '0원 배달'까지…중 "배달앱 공정 경...
- 9또 '신기록' 쓴 BTS…위버스 가입자 3천만 명 ...
- 10[내일날씨] 전국 곳곳 소나기…낮 최고기온 34도
투데이 포커스
화제의 뉴스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