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 이후 서울 송파구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 안내판에 정부 관계부처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이 붙어있다. [사진 = 뉴스1] |
다만 2단계 시행 이후에는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전반적으로 하락했는데, 계엄령 등 정치적 불안과 1단계 대출 규제에서 더 강한 2단계 규제‘라는 점에서 기저 효과로 분석된다.
23일 신한투자증권 자산관리컨설팅부가 한국부동산원의 아파트 매매거래 통계(가구수 기준)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스트레스 DSR 1단계 시행 직후 6개월(2024년 2∼7월) 전국 아파트 월평균 거래량은 25만8995건으로 시행 전 6개월(2023년 8월∼2024년 1월) 대비 26.8% 증가했다.
이 기간 서울 거래량이 1만7582건에서 3만1837건으로 81.1% 늘며 거래량 증가를 견인했다. 경기는 4만9854건에서 7만1999건으로 44.4%, 인천은 1만2056건에서 1만7335건으로 43.8% 각각 증가하며 수도권 전체적으로 상승 폭이 컸다.
반면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은 12만4734건에서 13만7824건으로 증가율이 10.5%에 그쳐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
| 스트레스 DSR 1·2단계 시행 전후 6개월 간 아파트 매매 거래량 [자료 = 신한투자증권] |
서울 내부에서도 지역별로 거래량이 크게 갈렸다.
강남 3구의 경우 서초구가 800건에서 1674건으로 109.3%, 강남구가 1182건에서 1927건으로 63.0%, 송파구는 1229건에서 2317건으로 88.5% 각각 늘어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이에 비해 강북구는 458건에서 488건으로 6.6%, 금천구는 286건에서 419건으로 46.5% 증가에 그쳤다.
눈길을 끄는 점은 강남 3구에 속하지 않은 광진구(122.7%), 마포구(120.4%), 강동구(110.7%)의 거래량 증가율이다. 해당 지역에 중산층 실수요자 비중이 높고, 주택거래 시 대출이 필요하긴 하나 DSR 규제 기준 범위에서 상환이 가능한 안정적 소득 수준을 갖춘 수요자들이 많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경기도에서 주요 지역 중심으로 거래량이 크게 증가했다. 과천시는 214건→534건으로 무려 149.5%나 증가했고, 성남시와 하남시도 각각 125.3%(285건→642건), 112.1%(999건→2119건)로 증가폭이 컸다. 반면 의왕시는 -2.4%(807건→788건), 포천시 -5.2%(363건→ 382건) 감소했다.
한편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 전후로는 기준금리 인하 요인이 있었음에도 강화된 대출심사 요건, 비상계엄 사태 등 정치적 불확실성 영향으로 관망세가 짙어져 전반적으로 거래량이 하락했다.
2단계 시행 후 6개월간(2024년 9월∼2025년 2월) 전국 거래량은 22만2739건으로 시행 전 6개월(2024년 3∼8월) 27만3578건 대비 18.6% 감소했다.
이 기간 서울은 33.8%, 경기는 24.2%, 인천은 31.7% 거래량이 줄어 감소세가 두드러졌다. 반면 지방은 종합부동산세의 1가구 1주택자 특례 적용 범위 확대 등 영향으로 감소폭이 9.8%로 수도권보다 작았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스트레스 DSR 3단계는 모든 가계대출에 확대 적용되는 만큼 지방과 수도권 외곽의 거래 위축이 심화할 가능성이 있다”며 “반면 서울 강남과 용산, 경기도 과천 등 선도 지역은 자산가 중심 시장으로 재편돼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양 전문위원은 이어 “내 집 마련이 더 어려워지는 계층을 위해 ‘투기 억제’보다 ‘실수요 보호’에 맞춘 정부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화제의 뉴스
오늘의 이슈픽
인기 영상
가장 많이 본 뉴스
- 1트럼프 관세 발언에 비트코인 급락…11만 달러선 무...
- 2트럼프 'EU 50% 관세' 발언에 뉴욕증시 하락
- 3[밸류업 5000] 직접 뛰는 금융지주 회장들…해외...
- 4예보, MG손보 정리 착수…300억 출자해 가교보험...
- 5은행권 예금금리 하락에…상호금융 수신잔액 증가
- 6트럼프 "EU에 6월 1일부터 50% 관세"…대서양...
- 7[크립토 인사이트] 수이 (Sui), 차세대 인터넷...
- 8기준금리 결정 주목…생산·소비·소득·세수 줄줄이 공...
- 9[생생한 주식쇼 생쇼] 우진엔텍 (457550), ...
- 10매일경제TV증시 오늘 ‘핫이슈’ “감세법안 몰아치는...
투데이 포커스
화제의 뉴스
포토뉴스
![[집중취재] 호반 침묵, 한진 방어…'지분경쟁' 서막](https://imgmm.mbn.co.kr/vod/news/103/2025/05/22/20250522164138_10_103_0_MM1005561925_4_245.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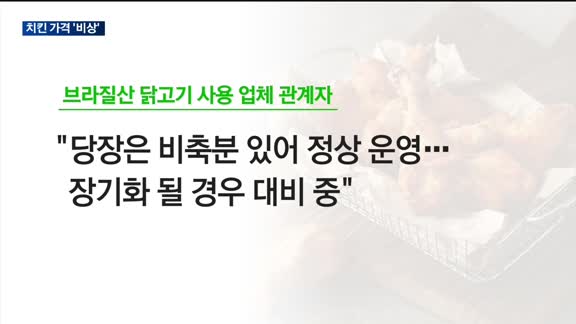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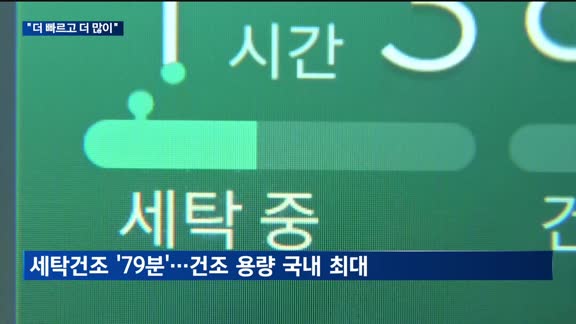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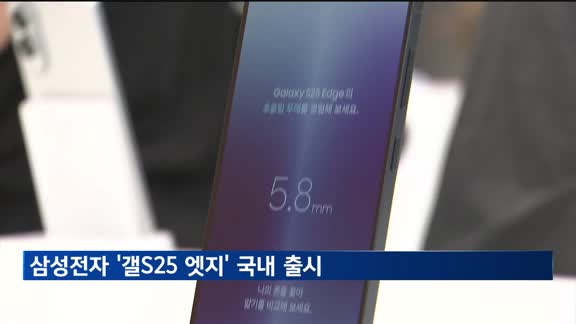

![[밸류업 5000] 직접 뛰는 금융지주 회장들…해외서 '밸류업 세일즈'](https://imgmm.mbn.co.kr/vod/news/103/2025/05/23/20250523163911_10_103_0_MM1005562732_4_74.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