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사진=연합뉴스] |
유연근무제를 활용하지 않는 근로자 중 절반가량은 앞으로 유연근무제를 적용받기를 희망했습니다.
오늘(1일)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와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기준 임금근로자의 유연근무제 활용 비율은 15.0%로 집계됐습니다.
전년 동월보다 0.6%p 하락한 수준입니다.
유연근무제 활용 비율은 정규직이 비정규직보다 크게 높았습니다.
정규직 근로자의 유연근무제 활용 비율은 20.1%로 전년 동월보다 0.6%p 상승했으나, 비정규직 근로자는 2.2%p 하락해 6.9%에 그쳤습니다.
유연근무제를 활용한 근로자들의 유형(중복응답)을 살펴보면, 시차출퇴근제가 35.0%를 차지해 가장 많았습니다.
탄력적 근무제(29.5%), 선택적 근무시간제(25.4%) 순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근무제(12.0%)나 재택·원격근무제(15.9%) 비중은 비교적 적었습니다.
유연근무제란 근로자와 사업자가 근무시간이나 장소를 선택·조정하여 일과 가정을 조화롭게 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탄력적 근무제는 일이 많은 시기의 근로시간을 늘리고 적은 시기의 근로시간을 줄여 정해진 근로시간을 맞추는 제도이며, 선택적 근무시간제는 정해진 근로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주당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하루 근무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는 형태입니다.
시차 출퇴근제의 경우 출퇴근 시간만 자율적으로 조정하고, 근로시간 단축근무제는 전일제 근로자가 필요시 일정 기간 근로시간을 단축해 근무하는 방식입니다.
유연근무제를 활용하지는 않는 임금근로자 가운데 향후 유연근무제 활용을 희망하는 근로자 비율은 48.1%로 나타났습니다.
전년보다 1.1%p 늘어난 수준입니다.
이들이 가장 희망하는 근무 형태는 선택적 근무시간제(34.0%)였으며, 그다음으로는 탄력적 근무제(29.4%), 근로시간 단축근무제(25.2%) 순이었습니다.
이는 근로자들이 일정한 자율성을 가지고 근무 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제도 선호가 높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유연근무제를 활용해본 직장인 다수가 일반적인 근무 형태보다 생산성 측면에서 뒤처지지 않는다고 느낀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한국노동연구원의 '2022년도 한국 가구와 개인의 경제활동' 보고서에 따르면 유연근무제를 활용해본 임금 근로자를 대상으로 각 제도에 대한 생각을 묻자 시차출퇴근제, 선택근무제, 원격근무제, 재택근무제 순으로 생산성에 긍정적인 답변이 많았습니다.
시차 출퇴근 경험자의 53.1%는 이 제도가 일반 근무 형태보다 '더 생산적'이라고 답했다. '차이가 없다'는 응답은 40.8%였고, '생산적이지 않다'는 응답은 6.1%였습니다.
선택근무제는 41.8%가, 원격근무제는 34.7%가 일반 형태보다 더 생산적이라고 답했습니다.
[ 구민정 기자 / koo.minjung@mktv.co.kr ]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화제의 뉴스
오늘의 이슈픽
인기 영상
가장 많이 본 뉴스
- 1[내일날씨] 구름 많고 흐림…강원·경북 강풍 주의
- 2환율, 미·중 갈등 완화 기대에 15.7원 하락…계...
- 3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무죄판결 파기환송…유...
- 4백종원 더본코리아, 가맹점에 50억 푼다…"3개월간...
- 5[밸류업 5000] '밸류업' 드라이브에 5대 금융...
- 6증시 오늘 '핫이슈'…"'코로나 시절' 회귀 국제유...
- 7“비트코인 10개 모교에 기부했어요”...받은 대학...
- 8젊고 건강하다면 '5세대 실손 보험' 고려할만
- 9한신평 "SKT, 가입자 이탈 지속시 최상위권 시장...
- 10대명소노, 에어프레미아 인수 계획 철회…타이어뱅크에...
투데이 포커스
화제의 뉴스
포토뉴스
![[밸류업 5000] '밸류업' 드라이브에 5대 금융지주 주가 상승세](https://imgmm.mbn.co.kr/vod/news/103/2025/05/02/20250502163631_10_103_0_MM1005543181_4_91.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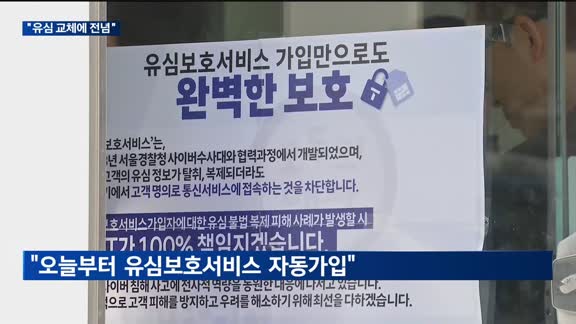







![[밸류업 5000] KAI "2027년까지 매출 연평균 20% 이상 성장"](https://imgmm.mbn.co.kr/vod/news/103/2025/05/02/20250502163028_10_103_0_MM1005543155_4_2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