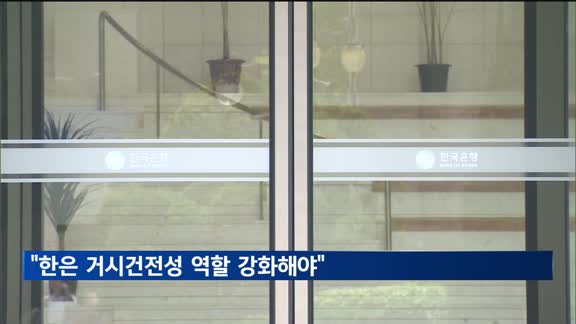|
【 앵커멘트 】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우리나라의 임상시험 승인 건수가 크게 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글로벌 순위도 8위에서 6위로 두 계단이나 뛰었는데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 같은 '임상 강국'으로 떠오른 데에는 어두운 이면이 있다고 합니다.
고진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해 국내에서 승인된 임상시험 건수는 모두 799건.
전년보다 12% 증가하며, 전 세계에서 6번째로 임상시험이 많은 나라가 됐습니다.
임상시험은 최근 3년간 지속해서 증가했는데, 이 같은 흐름은 로슈와 엠에스디 등 해외 제약사들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상위 20개 기관을 보면, 지난해 국내 제약사 4곳이 68건의 임상시험을 승인받은 반면, 해외 제약사는 6곳이 114건의 임상을 승인받았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임상시험 수행 역량이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게 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해외 제약사들의 임상시험이 국내로 몰리는 또 다른 배경에는 정부의 허술한 안전관리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임상시험은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지는 실험이므로 안전장치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관련 규정이 미흡하다는 겁니다.
▶ 인터뷰(☎) : 김남희 / 서울대 공익법률센터 교수
- "법에 임상시험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 적절하게 보상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는것 말고는 다른 기준이 없어요. 결국 우리나라 임상시험이 활성화된 이유 중 하나가 임상시험 피해가 발생해도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피해가 발생해도 지불해야할 비용이 적은 나라라 활성화된 측면도 있지 않나."
현재 정부는 임상시험 부작용 관리를 임상시험 의뢰자와 시험기관의 보고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연구진과 의뢰자가 함구하면 문제가 은폐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합니다.
이 때문에 임상 피해는 매년 증가하는데도 피해 구제는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해외 제약사들의 참여로 국내 임상이 활성화되고 있는 만큼, 조속히 안전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매일경제TV 고진경입니다. [ jkkoh@mk.co.kr ]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화제의 뉴스
오늘의 이슈픽
인기 영상
가장 많이 본 뉴스
- 1가상화폐 3개 법안 미 하원 통과…'엑스알피' 최고...
- 2K-방산주, 조정 후 반등…하반기 날아오를까
- 3[집중취재] 한미 관세협상 본게임…막판 '조율 진통...
- 4"SK하이닉스 2026년 HBM 물량 확정까지는 노...
- 5[밸류업5000] 밸류업에서 상법개정까지…금융주 질...
- 6증시 오늘 '핫이슈'…"MSCI 8월 정기변경 심사...
- 7[경제토크쇼픽] 이창영 “지방은행 개념 ‘지역은행’...
- 8'홈케어'가 바꾼 가전…'셀프케어' 열풍에 웰니스 ...
- 9이재용, 10년 사법리스크 털었다…재계 "한국경제에...
- 10엔지더블유, 늘푸른농장과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
투데이 포커스
화제의 뉴스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