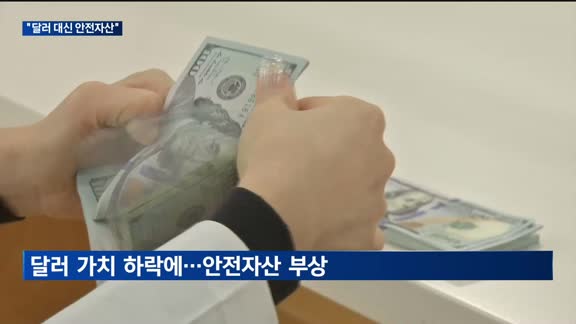|
어려워진 경기 상황에 부실채권(NPL·고정이하여신) 관련 사업 규모가 날로 커지고 있다. 지난해 국내 부실채권 투자사가 역대 최대 규모의 투자를 진행하며 은행권에서만 8조원 넘는 연체 대출을 사들인 것으로 집계됐다. 부실채권 사업을 하는 기업들의 투자 집행 실적 역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을 것으로 관측된다.
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진 은행이 3개월 이상 연체 대출을 대거 정리하며 투자사 입장에서는 큰 장이 선 셈이다. 이에 주요 금융지주는 물론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 2금융권까지 부실채권 전문사 육성에 나서며 부실채권 산업이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19일 삼일PwC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은행은 총 8조3100억원어치의 부실채권을 매각했다. 이는 전년 동기 5조4300억원과 비교해 50% 이상 늘어난 수치일 뿐 아니라 역사상 최대 규모다. 전체 매각 부실채권 중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IBK기업은행 등 6대 은행에서 매각한 것이 6조4100억원으로 77%를 차지했다.
금융사는 3개월 이상 연체된 고정이하여신을 장부상에서 지워버리는 '상각'이나 헐값에 넘기는 '매각'을 통해 부실채권 비율을 낮춘다. 이 중 작년엔 소액이라도 건지기 위한 매각 작업이 특히 활발했던 것이다. 금융당국이 건전성 제고를 주문함에 따라 은행 쪽에서 거래가에 대한 눈높이를 대폭 낮춘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지난해 말 4대 금융그룹의 부실채권 잔액은 10조8700억원으로 전년 대비 3조원 가까이 늘었다.
반대로 부실채권을 인수하는 전문기업 입장에서는 작년이 '저가 매입'을 위한 투자 호기였다. '건전성 관리'에 불붙은 금융사가 앞다퉈 부실채권을 내놨기 때문이다. 아울러 은행의 부실채권은 특히 타 금융권에서 발생한 것보다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받는다. 부실채권 투자 전문사는 금융사로부터 할인된 가격에 채권을 인수해 추후 해당 채권의 담보가 경매에서 팔리면 우선순위에 따라 배당받는데, 은행은 보통 같은 담보에 1순위 저당권을 설정하기 때문이다.
이에 1·2금융권 가리지 않고 부실채권 투자 전문사를 키우며 경쟁이 치열해지는 추세다. 일단 금융지주 계열 부실채권 투자 전문회사들이 시장 확대를 전망하며 경쟁력 강화에 나섰다. 하나금융그룹의 하나에프앤아이는 매년 시장 점유율 10~30%를 차지하며 연합자산관리(유암코)에 이어 2위 사업자로 인정받는다. 하나금융지주는 지난해 4분기엔 하나에프앤아이를 완전 자회사로 편입했다.
우리금융그룹의 우리금융에프앤아이도 2022년 설립된 후 꾸준히 역량을 제고해왔다. 우리금융에프앤아이는 코로나19 이후 시장에 진입하면서 조기 안착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상호금융을 비롯한 제2금융권에서도 부실채권 투자사 설립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신협은 지난해 부실채권 자회사 'KCU NPL 대부'를 세웠고, 새마을금고도 중앙회 차원의 부실채권 전문회사 설립을 준비 중이다.
[박창영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화제의 뉴스
오늘의 이슈픽
인기 영상
가장 많이 본 뉴스
- 1SK실트론 경영권 매각추진 소식에 구미 경제계·노동...
- 2한덕수 "국익 위해 마지막 소명 다할 것"
- 3MBN '2025 코리아트롯페스티벌' 예매 시작…송...
- 4[생생한 주식쇼 생쇼] 인스웨이브시스템즈 (4505...
- 5더본코리아, 식품위생관리시스템 전면 재정비…"신뢰회...
- 6[집중취재] "새우 등 터질라"…한국경제, 미중 무...
- 7'오락가락' 미 관세정책에 안전자산 선호…금·엔화 ...
- 8이번엔 전자제품 관세 혼란…배터리사도 대미투자 차질...
- 9정부, 에너지·의료·행정에 양자내성암호 시범 도입
- 10증시 오늘 '핫이슈'…"트럼프가 위축된다? 최대 피...
투데이 포커스
화제의 뉴스
포토뉴스
![[집중취재] "새우 등 터질라"…한국경제, 미중 무역전쟁에 '빨간불'](https://imgmm.mbn.co.kr/vod/news/103/2025/04/15/20250415163828_10_103_0_MM1005526202_4_248.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