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지난 일요일, 프란치스코 교황의 장례 미사가 있었다. 교황은 가난하고 소외받는 사람들에게 다가가고자 아시시의 프란치스코 성인을 따라 교황명을 지었다. 콘클라베에서 3분의 2 득표를 한 순간, 프란치스코 성인이 떠올랐다고 한다. 다른 교황들은 한 번도 쓴 적이 없는 이름이었다. 새 이름의 교황이 탄생한 것은 1100년 만이었다고 하니, 교황은 이전 가톨릭 수장들과는 다른 면이 있었던 게 분명하다.
그는 오래도록 기억될 것 같다. 교황명이 새롭거나 검소함 같은 품성보다는 사회에 방향을 제시했기 때문일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선 후보였던 2016년, 교황은 "다리를 만들지 않고 벽만 세우려 하는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니다"고 강조하며 멕시코와 미국 접경지역에서 미사를 집전했다. 미국 대통령이 장벽을 세우는 것을 교황은 막지 못했다. 그러나 '우리가 어디로 가는 것이 옳은 것인가'라는 방향을 알려주었다.
1952년 5월은 전쟁 중이었다. 임기를 두 달 앞뒀던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개헌을 시도하며 계엄을 선포했다. 국회는 표결로 이를 저지했으나 정부는 불응했고, 국회의원들은 압송됐다. 당시 부통령이었던 인촌 김성수는 이에 항거해 사퇴했다. 5000자에 이르는 사임 이유서에는 독재에 항거하는 이유가 정연하게 열거됐다. 전시임을 이유로 적당한 타협이 있을 수 있었으나, 인촌은 이를 거부했다(인촌은 사임 이유서에서 우남(이승만의 호)의 종신 집권을 예견했고, 우리가 지켜야 하는 가치에 대해 말했다). 이후 정부는 발췌 개헌, 사사오입 개헌 등 맹랑한 방법을 동원해 집권 연장을 추진했으며, 결말은 우리가 아는 대로다. 인촌이 전쟁 중 신변의 위험을 무릅쓰고 저항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정치인이기 이전에 교육자였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한다. 교육자와 종교인은 미래를 키우고 방향을 제시하는 사람들이기에 그럴 수 있었을 것이다.
작년 12월 초, 아닌 밤중에 홍두깨 같은 계엄이 있었다. 겁만 주려 했다든지, 계몽령이었다는 논리가 연속으로 나오자 많은 교수, 연구인이 성명을 발표하며 저항했다. 그 와중에 교육감이나 대학 총장 등 교육계 수장들의 성명서는 일절 볼 수 없었다. 대학 총장의 졸업사가 사회에 울림을 주던 시절이 있었다. 많은 신문이 대학 총장의 축사를 사회가 가야 할 방향으로 보도하던 때도 있었다.
지금 대학 총장들은 기업 경영인처럼 돼버린 지 오래다. 대학 규모가 커지면서 대학 총장의 경영자로의 변신은 당연하고, 지금보다 더 최고경영자(CEO)다워야 한다는 시각도 있으나, 혼란기에 교육계 수장들의 어른다운 목소리가 없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사회가 가벼워지고 있다는 방증이다.
최근 미국 아이비리그 대학 수장들의 행동과도 비교돼 더욱 씁쓸하다. 대학 규모가 커지고, 평가 순위가 올라간다고 해서 대학의 위상이 저절로 좋아지는 게 아니다. 오래전 제작됐던 '어른 김장하'라는 다큐멘터리가 다시 회자된다. 이번에 중요한 결정을 주도했던 헌법재판관을 비롯한 많은 이에게 선한 영향을 주었던 그의 삶이 다시 조명되고 있다. 어른 없는 사회에 대한 갈망이 엿보인다. 우리 사회의 어른을 기다려 본다.
[김세용 고려대 건축학과 교수]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화제의 뉴스
오늘의 이슈픽
인기 영상
가장 많이 본 뉴스
- 1[내일날씨] 구름 많고 흐림…강원·경북 강풍 주의
- 2환율, 미·중 갈등 완화 기대에 15.7원 하락…계...
- 3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무죄판결 파기환송…유...
- 4[오늘날씨] 어린이날 연휴 시작하는 주말…오후까지 ...
- 5[밸류업 5000] '밸류업' 드라이브에 5대 금융...
- 6백종원 더본코리아, 가맹점에 50억 푼다…"3개월간...
- 7증시 오늘 '핫이슈'…"'코로나 시절' 회귀 국제유...
- 8“비트코인 10개 모교에 기부했어요”...받은 대학...
- 9“할애비가 줄 건 없고 고금리를 선물할게”…은행에서...
- 10젊고 건강하다면 '5세대 실손 보험' 고려할만
투데이 포커스
화제의 뉴스
포토뉴스
![[밸류업 5000] '밸류업' 드라이브에 5대 금융지주 주가 상승세](https://imgmm.mbn.co.kr/vod/news/103/2025/05/02/20250502163631_10_103_0_MM1005543181_4_91.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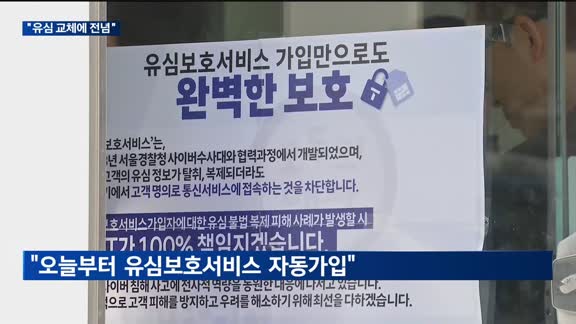







![[밸류업 5000] KAI "2027년까지 매출 연평균 20% 이상 성장"](https://imgmm.mbn.co.kr/vod/news/103/2025/05/02/20250502163028_10_103_0_MM1005543155_4_2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