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무슨 작업을 하고 계세요?"
웹페이지에서 생성형 인공지능(AI) 챗GPT에 접속하면 나오는 첫 화면 문구다. 업무와 학습 도구(툴)다운 질문이다. 챗GPT에 품는 대중의 기대도 엿볼 수 있다. 하지만 생성형 AI 이용자들의 가장 큰 관심은 따로 있었다. 정서적 목적이다.
경영 전문 저널인 미국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HBR)는 최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생성형 AI 유저들의 이용 실태를 조사한 기사를 실었다. 가장 극적인 변화는 1위 자리다. '심리 치료·동반자 관계(Therapy·Companionship)'를 목적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가장 많았다. 반면 지난해 1위를 차지했던 아이디어 생성(Generating ideas)은 6위로 내려왔다. HBR은 "AI를 통해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상실감을 정리하며, 이해와 위로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늘었다"고 평가했다.
HBR 조사는 고개를 갸웃거리게 한다. 생성형 AI는 고도화된 인공신경망을 기반으로 구동된다. 인간의 언어와 감정을 모사할 수 있을 뿐이다. 표정이나 눈빛과 같은 인간 특유의 비언어적 표현 능력도 갖추지 못했다. AI에게는 진정한 의미의 이해도, 감정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인간은 AI로 치유되고 위로받는다. 최근 관련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실제 인간 심리 전문가 반응보다 AI 반응에서 더 온기를 느끼고 위로를 받는 경향을 보였다. 심지어 반응의 주체가 AI라는 점을 알고 있어도 결과는 동일했다.
왜 가짜에 정서적으로 반응할까. 역설적으로 우리가 지독히 '인간적'이라서다. 사람은 비생명체도 의인화할 수 있는 능력을 지녔다. 대상이 AI라고 달라질 건 없다. 무의식적으로 인간의 특성을 부여하고 감정을 불어넣는다. 수많은 타인이 곁에 있는데도 AI에게 더 위로받을 수 있는 이유다. 특히 AI는 섣불리 판단하지 않고, 쉽게 지치지도 않으며, 맘대로 오해하지도 않는다. 속내는 물론 당장의 반응도 예측할 수 없는 타인보다 편하게 공감과 위로를 위탁할 수 있는 셈이다.
우리 모두는 그런 때가 있다. 체면이나 자존심, 도덕률, 죄책감 때문에 하고 싶은 말을 삼켜야 할 때, 그래서 아무도 없는 망망대해에 혼자 남겨진 기분이 들 때, 도처에 바닷물뿐이어서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이해받고 싶은 갈증을 해소할 수 없을 때, 심연 속을 연거푸 자맥질해도, 비틀어져 말라버린 마음만 따가워 덧날 때. 그럴 때, AI가 가짜란 사실이 과연 중요할까. 외로움을 해갈할 수 있다면. 어떤 종류의 외로움은 타인의 반응을 기대할 수 없는 감정이라면.
AI 치유에 마냥 거부감을 가질 건 아니다. AI를 포함해 여태까지 인류가 이룩한 문명은 인간의 불확실성을 피하고 예측 가능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진화해왔다. 변덕과 배신에 취약한 인간을 시스템에 묶어두고 사회 기능을 분업화했다. 타인과 대면하지 않고도 삶을 꾸려 나갈 수 있는 세상은 구현됐다. 외로움은 훨씬 더 커졌다. 뾰족한 해결 방법을 누구도 내놓지 못한 상황에서 AI 쓰임새가 대안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어쩌면 사람과 사람 사이를 잇는다는 '연결감'의 정의 자체도 AI의 고도화로 인해 바뀔지 모르는 일이다. 다만 예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 건 있다.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 말이다.
[최현재 글로벌경제부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화제의 뉴스
오늘의 이슈픽
인기 영상
가장 많이 본 뉴스
- 1[내일날씨] 구름 많고 흐림…강원·경북 강풍 주의
- 2환율, 미·중 갈등 완화 기대에 15.7원 하락…계...
- 3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무죄판결 파기환송…유...
- 4[오늘날씨] 어린이날 연휴 시작하는 주말…오후까지 ...
- 5[밸류업 5000] '밸류업' 드라이브에 5대 금융...
- 6백종원 더본코리아, 가맹점에 50억 푼다…"3개월간...
- 7증시 오늘 '핫이슈'…"'코로나 시절' 회귀 국제유...
- 8“비트코인 10개 모교에 기부했어요”...받은 대학...
- 9“할애비가 줄 건 없고 고금리를 선물할게”…은행에서...
- 10젊고 건강하다면 '5세대 실손 보험' 고려할만
투데이 포커스
화제의 뉴스
포토뉴스
![[밸류업 5000] '밸류업' 드라이브에 5대 금융지주 주가 상승세](https://imgmm.mbn.co.kr/vod/news/103/2025/05/02/20250502163631_10_103_0_MM1005543181_4_91.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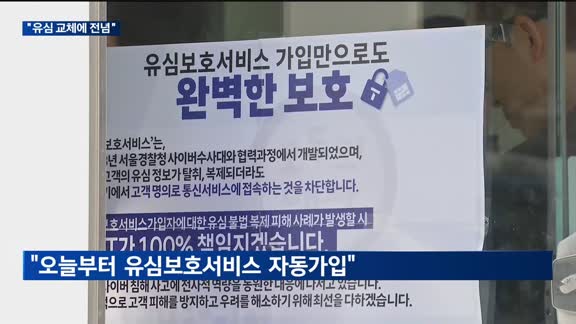







![[밸류업 5000] KAI "2027년까지 매출 연평균 20% 이상 성장"](https://imgmm.mbn.co.kr/vod/news/103/2025/05/02/20250502163028_10_103_0_MM1005543155_4_2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