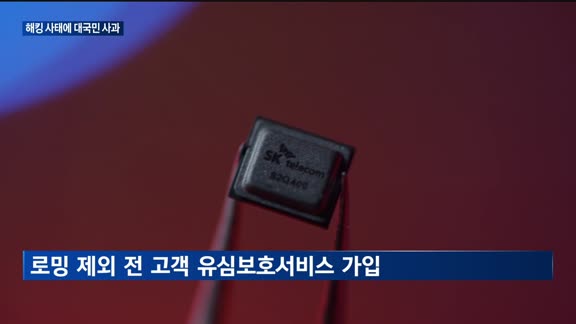|
오피스텔 월세 물건이 접수됐다. "보증금 2000만원에 월세로 놓아주세요. 그리고 전입신고는 안 하는 조건인 거 아시죠?" 아주 당연한 듯이 깔리는 전입신고 금지 조건 임대차 계약. "저는 그런 조건으로는 중개를 못해 드립니다"고 답했다.
임대인이 발끈한다. "아니 그동안 그런 식으로 계속 전세나 월세를 놓았는데 안 된다니요? 이상하게 일하시네…." 졸지에 이상하게 일하는, 일 못하는 중개사가 됐다. 그러나 아무리 불경기라도 나는 전입신고 안 하는 조건의 임대차 계약을 할 생각이 없다.
20년 차 개업 공인중개사인 내가 '그런 임대차 계약'을 안 하겠다는 이유는 그것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보호받아야 하는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이고 우리 법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무효'라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에 따르면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해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이어 제10조(강행규정)에 따르면 이 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다는 약정은 무효인데도 왜 임대인들은 그런 조건을 내거는 것일까? 먼저 세금 문제 때문이다. 오피스텔을 분양받을 때 업무용으로 해서 사업자등록을 하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고 기타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신 업무용으로만 사용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만약 임대차 계약을 하여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업무용이 아닌 주거용으로 판단돼 환급받았던 부가가치세를 추징당하게 된다.
또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사용할 때는 주택 수에 포함이 되지 않지만 주거용으로 사용하게 되면 주택 수에 포함되게 된다. 그럴 경우 오피스텔 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다주택자가 돼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이 될 수 있다. 양도소득세 또한 중과되기 때문에 전입신고를 꺼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전입신고까지 마쳐야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신고를 하고 싶지만 계약 시 특약사항에 합의했기 때문에 어찌해야 하나 난감하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해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넣었다면 정말 전입신고를 못 하는 것일까? 만약 이를 어길 시에는 계약을 파기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단서를 넣기도 하는데 과연 이런 특약이 어디까지 유효할까? 실제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기로 약정했지만 보증금을 잃을까 봐 임차인이 몰래 전입신고를 했고 이에 세금을 추징당하게 된 임대인이 계약 위반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한 사례가 있다.
법원은 전입신고를 못하게 하는 특약을 어기고 전입신고를 할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등의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은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유는 계약서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기로 한다'는 특약을 넣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집주인이 계약 당시부터 임차인이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방증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즉 민법 652조에 의거 '임차인이나 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다'고 보는 것이다.
임차인들은 알아야 한다. 주택임대차 계약을 할 때 △임차인들에게 불리한 약정은 무효라는 것 △무효라서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것 △약정을 어길 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단서가 있더라도 전혀 문제없다는 것이다.
[양정아 공인중개사]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화제의 뉴스
오늘의 이슈픽
인기 영상
가장 많이 본 뉴스
- 1SKAI인텔리전스, 유럽 디지털커머스 에이전시 '쎄...
- 2NH투자증권 일부 고객 금융소득 조회 오류…"외부 ...
- 3마이데이터로 떠나는 관광… NICE평가정보, '여행...
- 4롯데손보, 후순위채 콜옵션 행사 연기…당국 "시장영...
- 5'적자 전환' 동성제약, 회생절차 개시 신청…경영정...
- 6경제 격변기 재테크 전략은?…'2025 서울머니쇼'...
- 7매일경제TV증시 오늘 ‘핫이슈’ “깜짝 환율급락 ‘...
- 8"재생의료 게임체인저"…오가노이드사이언스, 오늘 코...
- 9면세업계, 실적 개선 기대감에 불황 끝?…고물가·고...
- 103주만에 고개 숙인 최태원…"정보보호 혁신위원회 구...
투데이 포커스
화제의 뉴스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