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경남 산청이 넉 달 만에 또다시 울었다. 산청군에서는 지난 19일 단 몇 시간 동안 쏟아진 폭우와 산사태로 14명이 희생됐다. 이는 최근 닷새간 발생한 전국 사망·실종자 27명의 절반을 넘는다.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있다가 한낮에 당한 참사다.
취재진이 찾은 산청읍 부리마을에선 작가의 꿈을 키우던 20대 청년이 토사에 매몰돼 숨졌다. 옆집의 70대 노부부도 집채만 한 흙더미에 목숨을 잃었다. 가족과 삶터, 일상이 한순간에 무너진 비극 앞에 유족들은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다.
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름철 재해 사전 대비를 누차 강조해왔다. 하지만 실제 재난이 닥치자 일선의 현장 대응은 무기력했다. 특히 산청군은 '뒷북 재난문자'로 비판받고 있다. 산청군은 이미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후인 오후 1시 50분에 3만3000명을 대상으로 '전 군민 대피령'을 내렸다. 여기엔 구체적인 대피 방법이나 장소 안내도 없었다. 통신망 단절로 문자를 받지 못한 주민도 많았다.
더욱이 산청군 공무원 650명 중 절반 넘는 인원이 관내가 아닌 진주시에 거주한다. 차로 30여 분 거리에 떨어져 있어 긴급 상황 시 현장 대응 능력이 제한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 '극한 호우'라는 이상기후 탓만 할 수 없는 이유다.
과거에 머물러 있는 재난 대응 시스템의 한계도 있다. 해마다 열리는 을지훈련과 재난대응훈련은 관(官) 주도로 이뤄지다 보니 실효성이 떨어진다. 재난이 발생하면 대부분 시민들은 정작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른다.
방재 구조물이나 첨단 경보 시스템 등 시설 확충도 물론 중요하다. 그러나 정작 '사람'이 반응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다. 일본은 동일본 대지진 이후 마을별로 쓰나미 대피로를 설치하고 주민들이 5분 내에 고지대로 피할 수 있도록 훈련한다.
우리도 마을 단위로 위험 지역을 사전에 파악하고 30분 내 대피 완료하는 실전 훈련을 정례화해야 한다. '훈련된 공동체'는 아주 강력한 제방 역할을 한다. 재난은 피할 수 없다. 하지만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분명히 있다.
[최승균 사회부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화제의 뉴스
오늘의 이슈픽
인기 영상
가장 많이 본 뉴스
- 1증시 오늘 '핫이슈' "한화솔루션 '컨콜' 미스터리...
- 2[밸류업 5000] 배당소득세 낮춘다지만…최고세율 ...
- 3[속보] 트럼프 "한국, 미국에 3천500억달러 투...
- 4트럼프 "한국, 상호관세 25%→15%…2주후 백악...
- 5한미 상호관세 15%로 조정…"2주내 정상회담"
- 6현대차, 미국 판매량 7만9천대 '15%' 증가…기...
- 7스타디움 접수한 치킨업계…BBQ·교촌·bhc '팬심...
- 8한미 관세협상 '선방'…농축산물 지키고 3,500억...
- 9중대재해 사망, 건설사에 집중…사망자 절반이 '건설...
- 10미 해군성 장관, 한화 필리조선소 방문…김동관 부회...
투데이 포커스
화제의 뉴스
포토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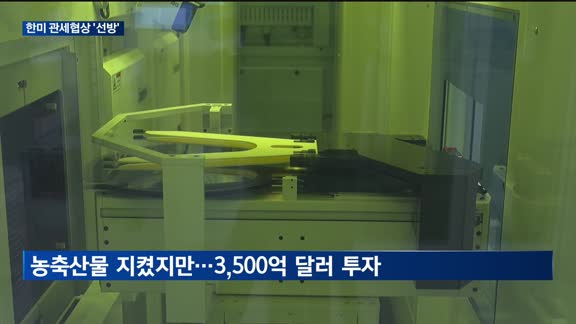

![[네트워크 365]광명시, '안양천 지방정원 시민참여정원 1기' 모집](https://imgmm.mbn.co.kr/vod/news/103/2025/07/31/20250731163453_10_103_0_MM1005626577_4_16.jpg)
![[네트워크 365]부산시·해수부 노조,"해양수도 조성" 한 목소리](https://imgmm.mbn.co.kr/vod/news/103/2025/07/31/20250731163422_10_103_0_MM1005626578_4_16.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