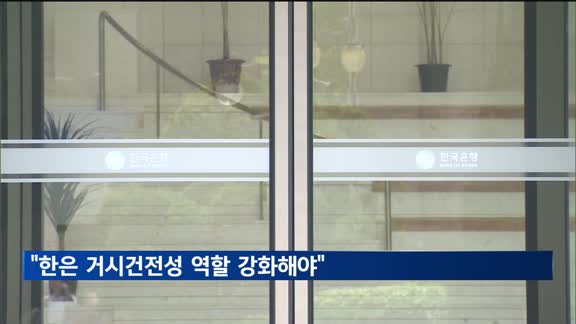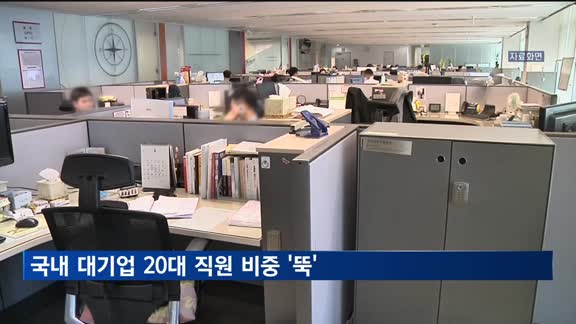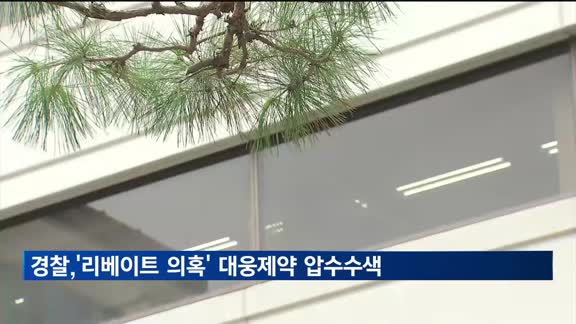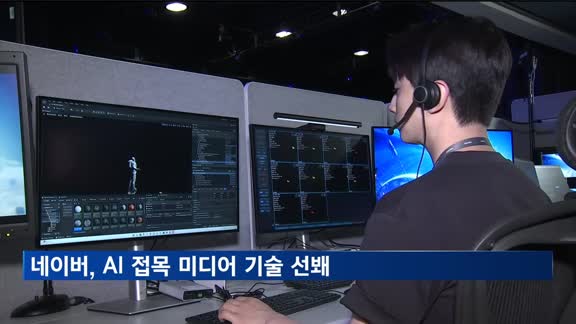조각은 '존재의 발굴'로 이해돼왔다. 나무를 깎고 대리석을 쪼는 과정을 통해 재료 내부에 잠재됐던 형상이 해방돼 노출되는 것. 조각가는 '존재하지 않던 것을 존재하게 하는 자'의 다른 이름이었다.
그러나 고(故) 류훈(1954~2014)의 조각은 이러한 오래된 조형적 믿음을 지극히 고요히 반박해낸다. 조각의 중앙이 대개 비어 있거나 결여돼 있어서다. 채우지 않고 비우기, 비움으로써 말하기. 그래서 류훈의 작품은 존재를 발굴하고 재료 속에 갇힌 형상을 해방시켜 관객과 만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의 빈자리를 바라보게 만든다. 그래서 그의 작품은 '침묵적 탐색'에 가까워 보인다.
류훈이 시도했던 '비어 있음'의 미학은, 흥미롭게도 그의 부친이자 추상회화 선구자인 고(故) 류경채(1920~1995)의 캔버스에서도 발견된다. 붓끝에서 남겨진 형상의 실체보다 그 너머의 여백이나 공백에 시선을 붙잡아두는 고요한 에너지까지도 동일하다.
부자(父子)는 '비어 있음'으로써 무엇을 이야기하려 했던 걸까.
류경채·류훈 부자의 2인전 '공(空)-존'이 열리는 서울 삼청로 학고재 갤러리에서 두 작가의 작품 40여 점을 살펴봤다. 아버지와 아들은 각자의 골방에서 서로 다른 언어로,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공(空)이라는 같은 태양을 바라보며 대화하고 있었다.
우선 아버지 류경채의 작품부터. 그의 작품 '염원 92-8'은 캔버스를 가득 메운 원과 그 중심을 이루는 사각형의 단순한 형태로 이뤄져 있다. 균형적인 배치 때문에, 그의 작품은 중앙부의 빈 공간을 바라보게 하는데, 이는 짙은 붉은색으로 장정된 낡은 성경책을 떠올리게 해 종교적인 명상으로 이어지고, 그와 함께 우주의 중심을 '형상'이라는 방식으로 질문한 불교식 만다라를 연상시킨다.
따지고 보면 만다라는 채움의 예술이면서, 동시에 비움의 예술이다. 우주의 질서를 정교하고 복잡한 형상으로 구현하지만, 동시에 그 형상의 사라짐을 전제 삼기 때문이다. 류경채의 캔버스는 그런 점에서 세계의 질서를 도식화하려 했던 만다라의 심연에 가닿는데, 그의 작품은 일반적인 만다라처럼 복잡하지 않고 단일한 색으로 귀결된다는 점에서 추상회화로 그린 만다라에 가깝다. 원(圓)이 생명의 회귀, 즉 탄생과 소멸과 순환을 뜻한다는 점에서 더 그렇다.
류경채의 또 다른 작품 '나무아미타불'은 공(空)의 사상이 더 두드러진다. 작품 중앙이 완벽하게 비어 있어서다. 그는 형상을 그리는 게 아닌, 바람을 그리는 화가였는지도 모른다.
아들 류훈의 작품은 공(空)을 주제 삼은 아버지의 회화적 질문에 대한 조형적인 응답처럼 보인다.
류훈의 작품 '공존' 시리즈에선 매끄러운 원과 그 중심의 빈 공간이 변주된다. 조도에 따라 표면의 빛감이 변화하는데, 빈 공간이야말로 작품의 중심이라는 듯이 비어 있다. 청동, 철, 스테인리스 등의 재료는 서로 다른 구조와 형태로 비어 있다. '있음'의 증거인 조각이 결국 '없음'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공(空)이란 주제는 명징해진다.
류훈의 평생 벗이자 동료 조각가인 안규철은 "형상을 만들고 형상을 그 조각이 놓인 공간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게 아니라, 형상이 있을 자리를 비우고 빈 자리를 보게 만드는 방식이 류훈의 작업"이라며 "그의 관심사는 형상 자체보다 형상 너머 빈 공간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었을까"고 전시장에서 회고했다. 이어 "류훈의 조각은 영혼을 바라보는 창문"이라고 상찬했다.
아버지 류경채가 남긴 그림에 아들이 조각을 붙이는 작업으로 구성된 '공존-꿈'은 이번 전시의 하이라이트다. 이 작품에서도 태양과 같은 붉은 원에 유독 눈길이 간다. 전시는 8월 9일까지.
[김유태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그러나 고(故) 류훈(1954~2014)의 조각은 이러한 오래된 조형적 믿음을 지극히 고요히 반박해낸다. 조각의 중앙이 대개 비어 있거나 결여돼 있어서다. 채우지 않고 비우기, 비움으로써 말하기. 그래서 류훈의 작품은 존재를 발굴하고 재료 속에 갇힌 형상을 해방시켜 관객과 만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의 빈자리를 바라보게 만든다. 그래서 그의 작품은 '침묵적 탐색'에 가까워 보인다.
 |
류훈이 시도했던 '비어 있음'의 미학은, 흥미롭게도 그의 부친이자 추상회화 선구자인 고(故) 류경채(1920~1995)의 캔버스에서도 발견된다. 붓끝에서 남겨진 형상의 실체보다 그 너머의 여백이나 공백에 시선을 붙잡아두는 고요한 에너지까지도 동일하다.
부자(父子)는 '비어 있음'으로써 무엇을 이야기하려 했던 걸까.
 |
류경채·류훈 부자의 2인전 '공(空)-존'이 열리는 서울 삼청로 학고재 갤러리에서 두 작가의 작품 40여 점을 살펴봤다. 아버지와 아들은 각자의 골방에서 서로 다른 언어로,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공(空)이라는 같은 태양을 바라보며 대화하고 있었다.
 |
우선 아버지 류경채의 작품부터. 그의 작품 '염원 92-8'은 캔버스를 가득 메운 원과 그 중심을 이루는 사각형의 단순한 형태로 이뤄져 있다. 균형적인 배치 때문에, 그의 작품은 중앙부의 빈 공간을 바라보게 하는데, 이는 짙은 붉은색으로 장정된 낡은 성경책을 떠올리게 해 종교적인 명상으로 이어지고, 그와 함께 우주의 중심을 '형상'이라는 방식으로 질문한 불교식 만다라를 연상시킨다.
따지고 보면 만다라는 채움의 예술이면서, 동시에 비움의 예술이다. 우주의 질서를 정교하고 복잡한 형상으로 구현하지만, 동시에 그 형상의 사라짐을 전제 삼기 때문이다. 류경채의 캔버스는 그런 점에서 세계의 질서를 도식화하려 했던 만다라의 심연에 가닿는데, 그의 작품은 일반적인 만다라처럼 복잡하지 않고 단일한 색으로 귀결된다는 점에서 추상회화로 그린 만다라에 가깝다. 원(圓)이 생명의 회귀, 즉 탄생과 소멸과 순환을 뜻한다는 점에서 더 그렇다.
 |
| 류경채 '나무아미타불'(1978). 학고재 |
류경채의 또 다른 작품 '나무아미타불'은 공(空)의 사상이 더 두드러진다. 작품 중앙이 완벽하게 비어 있어서다. 그는 형상을 그리는 게 아닌, 바람을 그리는 화가였는지도 모른다.
아들 류훈의 작품은 공(空)을 주제 삼은 아버지의 회화적 질문에 대한 조형적인 응답처럼 보인다.
류훈의 작품 '공존' 시리즈에선 매끄러운 원과 그 중심의 빈 공간이 변주된다. 조도에 따라 표면의 빛감이 변화하는데, 빈 공간이야말로 작품의 중심이라는 듯이 비어 있다. 청동, 철, 스테인리스 등의 재료는 서로 다른 구조와 형태로 비어 있다. '있음'의 증거인 조각이 결국 '없음'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공(空)이란 주제는 명징해진다.
류훈의 평생 벗이자 동료 조각가인 안규철은 "형상을 만들고 형상을 그 조각이 놓인 공간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게 아니라, 형상이 있을 자리를 비우고 빈 자리를 보게 만드는 방식이 류훈의 작업"이라며 "그의 관심사는 형상 자체보다 형상 너머 빈 공간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었을까"고 전시장에서 회고했다. 이어 "류훈의 조각은 영혼을 바라보는 창문"이라고 상찬했다.
아버지 류경채가 남긴 그림에 아들이 조각을 붙이는 작업으로 구성된 '공존-꿈'은 이번 전시의 하이라이트다. 이 작품에서도 태양과 같은 붉은 원에 유독 눈길이 간다. 전시는 8월 9일까지.
[김유태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화제의 뉴스
오늘의 이슈픽
인기 영상
가장 많이 본 뉴스
- 1미국행 해상운송비 대폭 상승…"컨테이너선 부족"
- 2삼성전자와는 다른 행보…LG전자, 중국기업 활용해 ...
- 3[CEO인사이트]'게임체인저'로 떠오른 '핵융합'…...
- 4[CEO인사이트] 나용수 서울대 원자핵공학과장 "2...
- 5증시 오늘 '핫이슈'…"이재용 회장 대법 선고, 삼...
- 6[CEO인사이트] '제2의 태양'을 만들어라…시작된...
- 7[이야기를 담다] 조훈현 9단, 바둑 명인의 끝나지...
- 8SGI서울보증 "신속한 복구와 고객 피해 최소화위해...
- 9[CEO인사이트]'제 2의 태양' 생성 도전기…나용...
- 10"피해 금액 전액 보상"…SGI서울보증, 시스템 장...
투데이 포커스
화제의 뉴스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