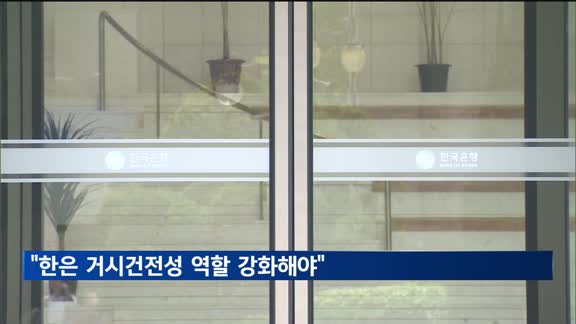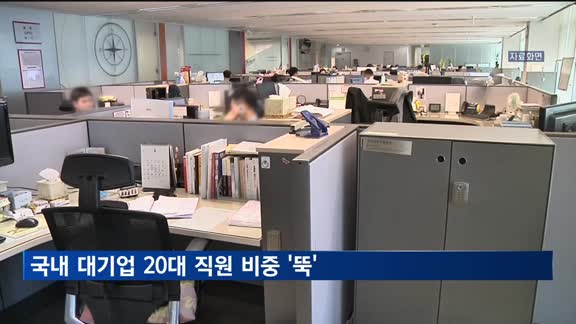|
| 남관 '태양에 비친 허물어진 고적(古跡)' |
미국에서 박사과정 동안 이끌어주신 지도 교수님의 이메일이 왔다. 내가 학교를 떠난 뒤 교수로 부임해서 이름만 들어본 교수가 한국에 오는데 도움을 좀 줄 수 있을지 부탁하는 내용이었다. 이 젊은 교수는 한국계 미국인으로 이탈리아 르네상스 미술에서 중심 인물과 배경의 관계를 뒤집어 해석하는 획기적인 연구로 주목받는 학자다. 아시아계로서 미술사의 핵심 분야인 르네상스 미술사 교수가 된 것은 진보적이라는 미술사 학계에서도 유리천장을 뚫은 드문 사례다.
그런 그가 추상 미술의 대가 남관(南寬)의 작품을 볼 수 있게 도와달라는 부탁을 했다. 남관은 1911년에 태어나 일제시대와 6·25전쟁으로 황폐해진 세상의 비극과 희미한 희망을 추상화로 그린 화가로, 1990년 타계할 때까지 왕성하게 활동하며 우리나라 현대미술을 이끈 거장이었다. 다소 늦은 40대에 10여 년간 파리에서 활동하기도 했는데, 여기 있는 '태양에 비친 허물어진 고적(古跡)'은 참담한 현실에서도 다시 일어서려는 인간성을 보여줘 이미 60년 전 국제 평단을 매혹시키며 1966년 망통 비엔날레에서 대상을 받은 그의 대표작이다.
아무리 한국계라 해도, 갑자기 르네상스 전공자가 왜 남관에게 관심을 가졌는지 무척 궁금했다. 급히 연락을 돌려, 작품을 소장하고 있을 듯한 갤러리 대표님께 부탁드려 몇 점을 볼 수 있게 되었다. 처음 가는 곳 입구에서 교수를 만나 간단히 인사를 나누고, 갤러리 대표의 안내로 드디어 남관의 작품 앞에 섰다. 그리고 그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는 단숨에 우리를 사로잡았다.
교수가 남관에게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또 다른 인물, 이근배 때문이었다. 1914년생인 이근배는 평양의학전문학교 졸업 후 일본에서 의학박사 학위를 받고 여러 대학에서 생화학을 가르쳤다. 이후 유엔민간원조군에서 활동하던 프랑스인 의사의 도움으로 프랑스, 이탈리아, 미국으로 유학을 다녀오기도 했다.
더 흥미로운 점은 이 생화학자가 20여 년간 몰두해 완성한 역작이 16세기 르네상스 미술사의 고전인 조르조 바사리의 '이탈리아 르네상스 미술가평전' 한국어 번역판이라는 사실이다. 여기서 르네상스 전문가의 눈이 반짝였다. 바사리는 16세기 이탈리아에서 당대 예술가들의 삶과 작품을 기록하여, 미술사라는 개념도 없던 시대에 이미 후대 연구의 토대를 마련한 인물이었다. 우리 모두 미술과 별 관련 없어 보이는 생화학자가 바사리를 번역한 이유가 궁금할 수밖에 없었다.
바사리-이근배-남관으로 이어지는 인연은 2025년 초여름의 어느 아침, 미술사가, 갤러리스트, 미술관장 세 명을 한 자리에 모아주었다. 마치 앨리스의 토끼굴에 빠진 듯, 우리는 옛 거인들을 뒤쫓느라 첫 만남이 무색하게 신나게 상상의 나래를 펼쳤다. 아마도 40대 나이에 유학을 떠난 남관과 이근배는 프랑스에서 친했나 보다. 1987년 '미술가 평전' 출판 기념회 '발기인' 명단에도 남관의 이름이 있어, 두 사람이 오래 교류했음을 짐작해 보았다.
몇 시간 동안 우리 셋은 머리를 맞대고 격동의 20세기를 산 남관이 과연 르네상스 미학에 관심이 있었을지, 또 생화학자 친구와 어떤 미술 이야기를 나누었을지를 오래도록 헤아렸다. 물론 앞으로 더 깊고 많은 연구가 절실하지만, 남관이 데콜라주 기법으로 캔버스 위에 신문지와 천 조각을 붙였다가 한 겹씩 벗겨내었던 작업이 르네상스 미술가들이 고대 그리스·로마 유산을 탐구하며 인류의 기원에 천착했던 태도와 닮아 있지 않을까 하는 가설을 세우면서 우리는 토론을 마무리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깨달았다. 모든 것이 데이터로 수집되고 분석되는 시대에도, 우연한 인연이 빚어내는 대화에서 피어나는 통찰, 예상치 못한 만남이 불러낸 새로운 질문, 그리고 끝내 무언가를 창조하고 알아내려는 의지가 우리 존재를 확인시켜 준다는 것을. 그것이 바로 인간의 가장 깊은 본질이 아닐까. 그 덕분에 우리는 여전히 이 세계를 매일 새롭게 살아가는 의미 있는 존재로 남아 있을 수 있는 것 아닐까. 옛 어른들에게 고마운 초여름이었다.
 |
[이지현 OCI미술관장(미술사)]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화제의 뉴스
오늘의 이슈픽
인기 영상
가장 많이 본 뉴스
- 1미국 주식 보관액 183조 원 '역대 최고'…테슬라...
- 2다음 주 도우인시스·뉴로핏 코스닥 상장
- 3경남 산청 산사태에 국가소방동원령 발령…중대본 "총...
- 4부산 '르엘 리버파크 센텀' 등 7천956가구 분양
- 5김정관 산업장관, 전력 수급 상황 점검…"안정적 공...
- 6[내일날씨] 전국 곳곳 소나기…낮 최고기온 34도
- 7또 '신기록' 쓴 BTS…위버스 가입자 3천만 명 ...
- 8주문 폭주에 '0원 배달'까지…중 "배달앱 공정 경...
- 97급공채 1차 필기시험 응시율 59.9%…작년보다 ...
- 10“우리 아이도 가르쳐주세요”…잘생긴 수영코치 보려고...
투데이 포커스
화제의 뉴스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