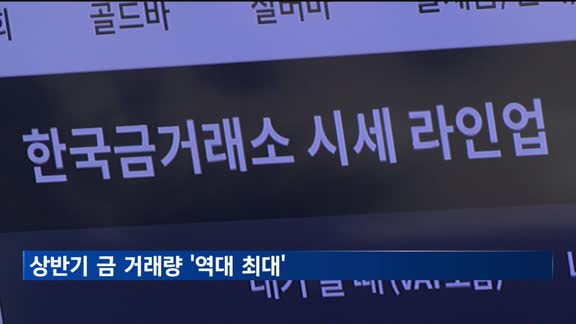공무상 자살 22건, 3년 새 3배 증가
정신질환 요양자 274명, 일반의 11배
심리진단 넘어 조직문화 개선 촉구
정신질환 요양자 274명, 일반의 11배
심리진단 넘어 조직문화 개선 촉구
 |
|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무원들이 점심 식사를 위해 청사를 나서고 있다. [뉴시스] |
10일 인사혁신처가 정부에 제출한 정부혁신 실행계획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공직의 잠재적 위험요인 진단을 위한 직무 위험 분석도구를 개발하겠다”며 “다양한 직무의 위험 수준을 계량적으로 측정·분석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발간한 공직 심리재해 진단 표준가이드의 후속 조치로, 정부는 공무원 건강 관리를 예방-보상-재활로 이어지는 순환 구조로 정착시킬 계획이다.
인사혁신처는 오는 8월까지 89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심리재해 진단체계를 마련하고, 이후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관련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다.
공무상 사망과 자살, 순직 사례는 증가 추세다. 정부에 따르면 공무상 사망자 수는 2018년 78명에서 2022년 109명으로 43% 늘었다. 이 가운데 자살·뇌·심혈관질환 등 질병 재해는 86건, 사고 재해는 23건이었다. 특히 공무상 자살은 2022년 22건으로, 2020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했다.
업무상 질병 가운데서는 우울증과 적응장애 등 정신질환이 가장 많았다. 인사혁신처의 2022년 공무상 재해보상 승인 자료에 따르면, 정신질환 요양자는 274명으로, 공무원 1만명당 2.14명꼴이었다. 이는 일반 근로자의 정신질환 관련 산업재해 요양 비율(0.19명)보다 11배 높은 수준이다.
업무량 증가, 악성민원, 경직된 조직문화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공직사회 내부에서는 단순 심리진단을 넘어, 근본적인 조직문화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인력에 맞춰 업무량과 기준을 조정하고, 업무 부담이나 악성민원 등 한계 상황에서 조직이 보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와 문화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화제의 뉴스
오늘의 이슈픽
인기 영상
가장 많이 본 뉴스
- 1상법 개정안 '절반의 합의'…"명분만 챙긴 반쪽짜리...
- 2빈번한 기술 유출에…정부, '반도체·디스플레이' 기...
- 31인 가구 1000만 시대 눈앞…유통업계 '1인용'...
- 4'안전자산' 금 거래량 '역대최대'…"단기적 조정도...
- 5제프 베이조스, 최근 아마존 주식 1조원어치 매도
- 6 [생생한 주식쇼 생쇼] 한화솔루션 (009830)...
- 7[애프터성공률] 주식남녀 / 애프터 공략주! SNT...
- 8아크,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 통합관리 플랫폼 오...
- 9[생생한 주식쇼 생쇼] 삼성전자(005930) 실적...
- 10밸류업 공시 2년차…156개사 참여, 주가 수익률·...
투데이 포커스
화제의 뉴스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