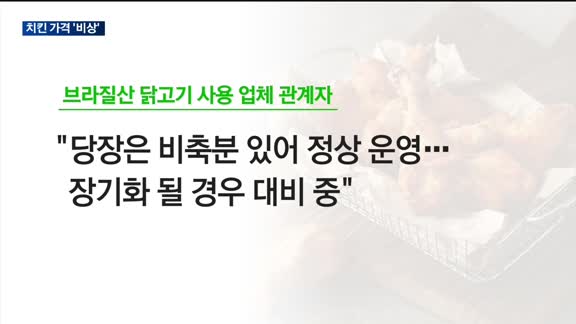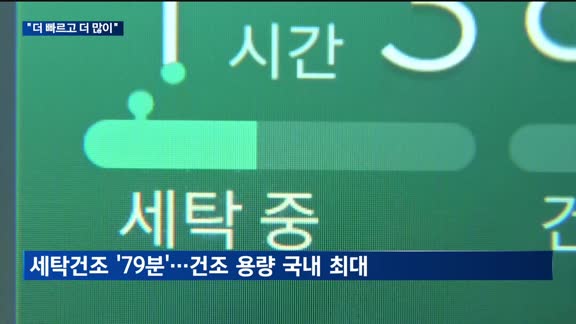|
2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작년 4분기 기준으로 푸본현대생명, 하나손해보험, KDB생명, iM라이프 등 다수 보험사가 해당 비율 50%에 미달한다. 롯데손해보험, MG손보 등은 0%도 맞추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급여력비율 규제는 보험사가 고객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건전성을 확보하라는 차원에서 마련된 것인데, 상당수 회사는 단지 숫자를 만드는 데만 급급해 후순위채 등 비교적 편한 방식으로 조달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권의 어느 업태에서도 기본자본 50% 수준을 맞추는 건 당연하게 여겨진다”며 “높은 수준의 규제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기본자본을 늘리는 방법은 사실상 증자와 순익 증대뿐이다.
금융당국이 보험업에 엄격한 회계를 강조하는 건 국내 보험사 건전성이 아직 글로벌 스탠더드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판단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MG손해보험은 건전성에 문제가 생겨 수차례 매각이 무산되다가 최근 예금보험공사 산하 임시 보험사로 편입됐다. 롯데손보는 지급여력비율 미달 때문에 후순위채 조기상환을 연기하기도 했다. 과거 북미와 일본에서도 보험사가 줄도산하며 가입자 불안을 키운 바 있는데 건전성을 보다 철저히 관리해 경영 부실을 선제적으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보험사가 예상손해율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가정함으로써 재무제표에 분칠을 하는 행태에도 제동을 걸 예정이다. 보험사 재무제표는 상품의 예상손해율을 낮게 측정할수록 현재의 당기순이익이 커지는 구조다. 이에 따라 보험사 최고경영자(CEO)는 예상손해율이 낮을 것이란 낙관적 가정을 통해 현재의 순이익을 크게 보이려는 유혹에 빠지기 쉽다.
그러나 실제로 발생한 손해율과 예상치의 차이가 크면 결국 추후엔 예실차(예상보험금과 실제 지출 간 차이) 손실로 반영된다는 점에서 부실을 미래로 전가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최근 회사 간 예상손해율이 제각각인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금융당국은 보험사가 예상손해율을 자의적으로 산출했는지를 판단하고, 명확한 근거 없이 손해율을 계산한 보험사들에 주의를 줄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지난 3년간 예실차가 ‘이익’ 또는 ‘손해’ 중 한 방향으로만 나온 기업을 점검하고 있다.
예상이 늘 정확할 수 없는 만큼 예실차가 크거나 작게 나타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다. 다만 한 회사에서 연속적으로 예실차 ‘이익’ 또는 ‘손해’만 나는 건 예상손해율을 뚜렷한 근거 없이 도출했다고 의심해볼 지점이 될 수 있다. 예상손해율은 실제손해율과 차이가 0에 가깝게 추정하는 게 목표가 돼야 하는데, 줄곧 너무 낙관적이거나 보수적으로 추산하는 경향이 보이는 회사엔 예상손해율 도출 근거를 요구할 방침이다. 회사 측에서 뚜렷한 근거 자료를 내놓지 못한다면 여기에 주의와 제재를 가하는 방식으로 금융당국은 시장에 예상손해율에 대한 간접적인 가이드라인을 준다는 목표다.
일련의 자본 규제와 회계 가이드라인이 잇달아 도입되며 국내 보험 시장에 본격적인 옥석 가리기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보험사가 기본자본 지급여력 비율을 맞추려면 내실 있는 영업이 필수로 요구된다. 기본자본은 자본금과 이익잉여금으로 이뤄지는데, 이를 위해서는 실제 이익을 많이 내고, 증자하는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손해율을 자의적으로 산정해 현재의 장부상 이익을 남긴 기업들에도 당장 제재가 들어가게 되면서 ‘고무줄 회계’ 역시 상당 부분 제어될 전망이다.
다만, 보험사 일각에서는 한 번에 다수의 규제가 도입되면서 시장에 충격이 올 것을 우려했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보험업권 회계제도 변화에 회사가 적응하는 데도 시간이 필요한데, 이렇게 규제가 몰아치듯 쏟아지면 건실한 보험사까지 휘청댈 수도 있다”고 말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화제의 뉴스
오늘의 이슈픽
인기 영상
가장 많이 본 뉴스
- 1육계협회, 국내 육계업체에 닭고기 공급 확대 요청
- 2"치킨값 또 오르나"…브라질산 닭고기 수입 중단에 ...
- 3[집중취재] 호반 침묵, 한진 방어…'지분경쟁' 서...
- 4재계, 자사주 소각 '속도'…'의무화' 바람 탄력
- 5공모주 시장 한파에도…케이뱅크 'IPO 재도전'
- 6한미 2차 관세협의 스타트…구글맵 등 협상 테이블에
- 7매일경제TV증시 오늘 ‘핫이슈’ “삼성물산이 ‘우주...
- 8한수원도 체코 법원에 '원전계약금지 가처분 취소하라...
- 9홈플러스, 배송 브랜드 '매직배송'으로 통합…"매장...
- 10"더 빠르고 더 많이"…삼성·LG '올인원 세탁건조...
투데이 포커스
화제의 뉴스
포토뉴스
![[집중취재] 호반 침묵, 한진 방어…'지분경쟁' 서막](https://imgmm.mbn.co.kr/vod/news/103/2025/05/22/20250522164138_10_103_0_MM1005561925_4_245.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