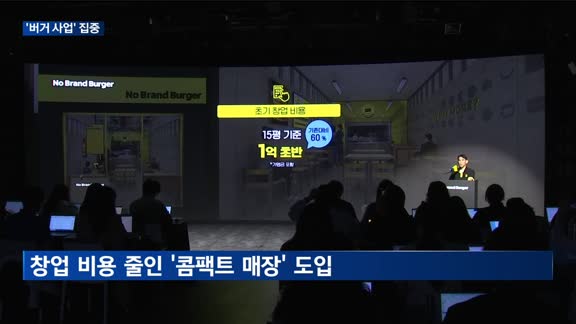|
| 방혜자 '하늘의 땅', 강요배 '허공과 나무', 권옥연 '살구꽃 필 무렵'(왼쪽부터 시계방향). 국립현대미술관 이건희컬렉션 |
강요배의 2005년작 '허공과 나무'는 구도가 독특하다. 캔버스 중심이 텅 비어 있어서다. 우측으로 비켜선 나무 한 그루, 그리고 상단의 가지 한 점을 제외하면 그곳엔 아무것도 그려져 있지 않다.
"바람은 영겁의 시간 속을 불어온다. 바람을 맞는 물과 돌과 땅거죽엔 시간이 각인된다. 장구한 시간 속에서 모든 것은 하나가 된다"(강요배 예술산문 '풍경의 깊이')는 문장을 되짚는다면, 강요배의 이 그림은 허공을 지나는 바람이 중심이 된다.
'허공과 나무'를 비롯해 한국 화단의 거성들의 작품을 한자리에서 확인 가능한 귀한 전시가 서울시립미술관 북서울미술관에서 열린다.
국립현대미술관과 지역미술관에 기증된 이건희컬렉션과 리움미술관 소장품, 아울러 서울시립미술관과 학고재 갤러리, 유족 소장품 등 60여 점을 모은 전시 '그림이라는 별세계: 이건희컬렉션과 함께'가 개막했다. 서울시립미술관 측에 따르면 "화가의 미의식을 재현시킨 별세계(別世界)"라는 이인성의 문장에서 제목을 가져왔다.
서울 노원구 하계역에서 5분 거리인 이곳 북서울미술관 1층 전시실에 들어서면, 근대 서양화가 이인성의 1934년작 '가을 어느 날'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다. 푸른 하늘 아래 모자(母子)로 추정되는 두 인물이 무심한 듯 식물 옆에 선 작품이다.
파란 창공과 모자가 선 붉은 땅의 대비가 선명하다.
1950년 납북 후 자취를 감춘 이인성은 생전에 "나에게는 적토(赤土)를 밟는 것이 청순(淸純)한 안정을 준다"고 말한 바 있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이인성의 저 회화는 피와 노을로 물들었던 당대 한국인들의 정서를 응축해낸다.
권옥연의 1991년작 '살구꽃 필 무렵'도 역시 한국적인 정서가 강한 회화다.
국립현대미술관에 기증된 이건희컬렉션 중 하나인 이 작품에는 얕은 구릉 위에 지어진 작은 누각 하나, 그 지붕 위로 거대한 솟대 하나가 서 있다. 또 그 위의 하늘엔 방패연 하나가 휘날린다. 하늘을 향한 염원을 담은 축(軸)으로서의 솟대와 연은, 뭔가는 소망하며 약속받기를 기다렸던 인간의 회화적인 편지처럼 느껴진다.
추상미술의 선구자 유영국의 1968년작 '산'도 빼놓을 수 없다.
강물과 산을 기호적으로 해석해내는 솜씨가 탁월하게 전개된 작품으로, 캔버스를 가로로 분할하는 선과 그 너머로 포개진 두 산을 직선으로 그려냈다. 단단하고 분명한 경계가 특징인데도, 왠지 모르게 마음이 평온해진다. 전남도립미술관이 소장한 이건희컬렉션 중 하나다.
강요배의 2005년작 '홍매'도 전시의 하이라이트다. 거친 질감의 매화나무 사이로 분홍빛 매화가 고결한 표정으로 고개를 들고 있다. 매화의 빛감이 은은해서,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고는 꽃을 쉽게 발견하긴 어렵다.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려는 그 수줍고 낮은 자세 때문에 매화는 더 고결하다.
전시실의 마지막 공간을 채우는 방혜자의 2011년작 '하늘의 땅'은 거대한 경이감을 선물해주는 작품이다. 한지를 접고 구기는 과정을 통해 부드러운 섬유질을 노출하고, 이를 다시 거대한 원으로 재구성했다. 절대적인 흰빛으로 귀결되는 동심원은 마치 세상을 바라보는 거대한 동공처럼 느껴진다.
최은주 서울시립미술관장은 "이번 전시에 소개된 작가들은 가장 오래된 예술의 매체인 회화로서의 자유, 아름다움, 내면, 이상향을 탐구하며 자신만의 세계를 구축한 이들"이라며 "그림을 그린다는 행위의 중요성과 회화 고유의 가치를 조명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이 시대에 여전히 유효한 이들의 회화 언어와 메시지를 재발견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시는 7월 20일까지. 무료.
[김유태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화제의 뉴스
오늘의 이슈픽
인기 영상
가장 많이 본 뉴스
- 1미·중 통상협상 개시…관세전쟁 해빙 전환점 될까
- 2이더리움 15% 폭등…가상화폐 시장 훈풍에 독주
- 3백종원 더본코리아, 5월 '반값 할인전' 돌입…"본...
- 4[내일날씨] '낮 최고 26도' 초여름 날씨…전국 ...
- 5비트코인 10만 5천달러선 육박…도지코인 21% 급...
- 6증시 오늘 '핫이슈'…"지주사 PBR 0.8배, 개...
- 7미·중 "무역협상 진전"…12일 공동성명 발표하기로
- 8뉴욕증시 혼조 마감…미·중 협상 앞두고 기대·경계 ...
- 9미중, 무역협상 첫날 10시간 '마라톤 협의'…모두...
- 10체코당국, 이번 주 '법원 한수원 계약제동' 항고…...
투데이 포커스
화제의 뉴스
포토뉴스
![[집중취재] 어두운 국내 경제 전망…발등에 불 떨어진 '경기 부양'](https://imgmm.mbn.co.kr/vod/news/103/2025/05/09/20250509164840_10_103_0_MM1005549295_4_259.jpg)
![[밸류업5000] 밸류업 시행 1년…자사주 취득액 연간 20조원 '첫 돌파'](https://imgmm.mbn.co.kr/vod/news/103/2025/05/09/20250509164840_10_103_0_MM1005549153_4_98.jpg)

![[밸류업 5000] 삼성전자, 밸류업 지수서 빠지나…공시 자료 미제출](https://imgmm.mbn.co.kr/vod/news/103/2025/05/09/20250509162952_10_103_0_MM1005549161_4_20.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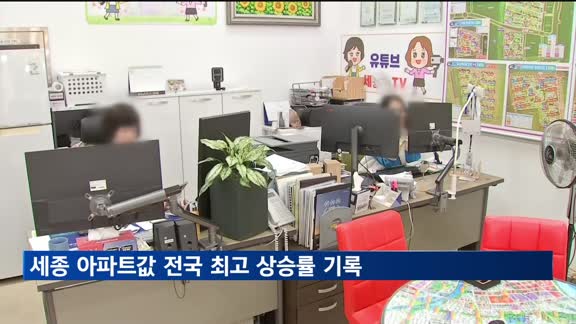
![[밸류업 5000] 코웨이, 1천100억 자사주 매입 결정](https://imgmm.mbn.co.kr/vod/news/103/2025/05/09/20250509162952_10_103_0_MM1005549160_4_2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