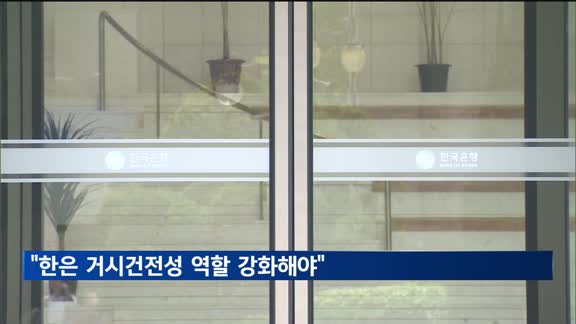|
사월이 되자 메이플 우듬지에 연둣빛이 스미기 시작했다. 거실 한편에 가만히 앉아 작은 우물 하나를 오래 들여다봤다. 한 뼘 조금 넘는 시루, 그 안에는 노란 콩나물들이 어깨를 비비며 자라고 있었다.
어릴 적 가을이 되면, 안방에는 커다란 시루가 윗목을 차지하고 있었다. 할머니는 갓 추수한 메주콩을 자루째 방에 들여놓았다. 그것을 상 위에 몇 줌씩 펼쳐놓고 밤늦도록 고르셨다. 벌레 먹은 콩은 메주를 쑤거나 두부를 만들었고 잘 여문 콩은 나물로 길러서 겨우내 국에, 무침에, 콩나물밥까지 밥상에 요긴하게 올리곤 했다. 어린 나는 할머니 곁에서 쟁반에 콩을 옮기며 놀았다. 조그마한 손이 놓친 콩들은 쉽게 바닥으로 굴러떨어졌다. 콩을 따라 나도 데구루루 굴렀다. 그런 나를 보며 콩처럼 동그랗게 웃으시던 할머니, 내리 딸 일곱을 낳은 엄마에게도, 뽀시락대며 성가시게 하던 우리들에게도 더없이 좋은 어르신이었다.
추수가 끝나고 겨울이 오면 마당에서 놀던 태양도 일찍 집으로 돌아갔다. 어느 날 저녁, 이웃 마을을 돌던 방물장수가 커다란 보따리를 이고 하룻밤 묵게 해달라며 문을 두드렸다. 저녁상을 물린 뒤였지만 엄마는 슬그머니 부엌으로 나가셨고 할머니는 무거운 짐부터 내려놓으라며 자리를 내어주셨다.
건넌방에서 언니들이 다투어 들어오고 아주머니는 큼지막한 보따리를 윗목에 풀어놓았다. 머리핀, 색실, 손거울, 가루분, 참빗…. 밤잠을 밀어낸 언니들의 들뜬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하다. 아주머니는 콩나물국에 밥을 말아, 잘 익은 배추김치를 척척 올려서 얼마나 달게 드시던지. 고르고 골라 한 가지씩 손에 쥔 언니들이 하나둘 건넌방으로 갔다.
맛있게 잘 먹었다면서 상을 물린 아주머니는 시루 위 검은 보자기를 들추고 한참이나 물을 주었다. 집에 두고 온 어린아이를 생각하는 듯, 할머니 무릎에서 졸음을 참고 있던 나를 가만히 쓰다듬어 주었다. 그 밤 콩나물처럼 촘촘한 이야기가 물소리에 섞여 밤늦도록 새끼 꼬듯 이어졌다.
나는 지금 미국에 살고 있다. 오래전 할머니처럼 희끗해진 모습으로 콩나물 시루 앞에 앉아 있다. 그 시절 내 작은 손이 쥐었던, 할머니 엄마 언니들 그리고 방물장수 아주머니의 손길마저 기억하고 있을 고향집 조롱박을 떠올리며 정성껏 물을 준다. 시루 아래에서 들리는, 낯선 이의 허기를 헤아리고 지친 어깨에서 가만히 짐을 내려주던 그 소리.
생각해 보니 할머니와 엄마의 손은 표주박이었다. 거친 손바닥을 둥글게 모아 어린 정수리에 한없이 물을 부어주셨던 손, 그 물을 마시고 자란 우리는 그분들이 평생 기른 콩나물이었다. 매일 듣던 당부는 시루 아래 물방울처럼, 내 삶을 키운 자양분이었다. 그때 나를 성장시킨 수많은 물소리는 지금쯤 아득히 흘러가 태평양이 되었겠다.
그러고 보면 둥근 이 지구도 하나의 커다란 콩나물시루일 듯, 나누는 따뜻한 말 한마디 정다운 눈빛 하나가 서로를 자라게 하는 맑은 물일 테니까. 오늘 밤, 허공 저 윗목에서 누군가 시루 덮개를 열고 물을 주는지 또르르, 밤새 봄비가 내린다.
[김인식 시인]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화제의 뉴스
오늘의 이슈픽
인기 영상
가장 많이 본 뉴스
- 1미국 주식 보관액 183조 원 '역대 최고'…테슬라...
- 2다음 주 도우인시스·뉴로핏 코스닥 상장
- 3경남 산청 산사태에 국가소방동원령 발령…중대본 "총...
- 4부산 '르엘 리버파크 센텀' 등 7천956가구 분양
- 5김정관 산업장관, 전력 수급 상황 점검…"안정적 공...
- 6[내일날씨] 전국 곳곳 소나기…낮 최고기온 34도
- 7또 '신기록' 쓴 BTS…위버스 가입자 3천만 명 ...
- 8주문 폭주에 '0원 배달'까지…중 "배달앱 공정 경...
- 97급공채 1차 필기시험 응시율 59.9%…작년보다 ...
- 10“우리 아이도 가르쳐주세요”…잘생긴 수영코치 보려고...
투데이 포커스
화제의 뉴스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