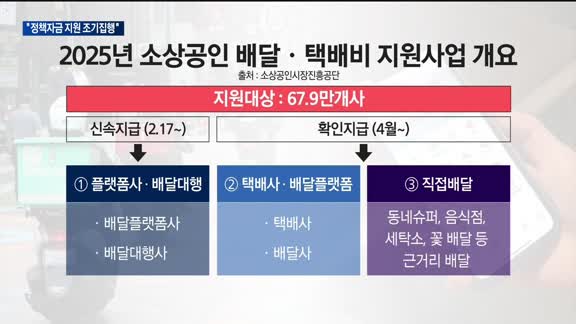우크라이나가 믿었던 미국에 버림받을 위기에 처하자 국내에서도 "역시 핵보유만이 살길"이라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 인터넷 커뮤니티는 물론 학계와 정치권에서도 핵무장론을 앞다퉈 제기한다. 우선 사용후 핵연료에 대한 농축·재처리 권리를 확보하자는 '준비론'부터 미국 트럼프 정부를 설득해 핵개발을 시작하자는 '개발론'까지 여러 의견이 분출한다. 북한이 최근 수년간 핵무기를 고도화하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한미군 분담금 대폭 인상을 예고한 게 핵무장론의 불쏘시개가 됐었다. 그러다가 최근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으로 다시 불이 붙었다. 미국이 전쟁 당사국인 우크라이나를 배제한 채 러시아와 종전 협상을 하고 우크라이나가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을 강요하자 한국도 나중에 '팽' 당할 수 있다는 공포가 엄습한 것이다.
핵무장론의 기저에는 과도한 자신감이 깔려 있다. '한국은 미국이 반대하지 않으면 언제든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다'는 논리다. 근거 없는 얘기는 아니다. 원전을 50년 가까이 운용한 노하우가 있고, 유럽과 중동에 수출까지 하는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손꼽히는 원자력 기술력을 갖고 있다. 핵탄두를 탑재하는 미사일도 세계 최고 수준이다.
그럼에도 핵보유는 상상 이상의 비용을 요구한다. 국제사회의 압박과 제재는 미국을 설득해 해결한다 하더라도 보유비용이라는 현실적 장벽에 가로막힌다. 핵탄두는 엄격하게 통제된 시설에 보관해야 하며, 방사능을 차단하는 여러 겹의 안전 장치가 필요하다. 성능이 저하될 수 있기 때문에 정기적인 검사와 유지관리를 해야 하는데, 재래식 무기와 비교할 수 없는 고가의 장비와 기술을 요구한다. 핵무기의 운용과 관련된 통제 시스템도 첨단 설비의 집약체다. 외부로부터의 테러, 해킹을 완벽하게 방어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이유로 미국도 핵무기 유지관리 비용으로만 매년 수백억 달러를 쓰고 있다. 주민 반대로 변전소도 제대로 짓지 못하는 우리나라는 핵농축·재처리 시설과 같은 고위험 시설을 짓기까지의 갈등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박만원 논설위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핵무장론의 기저에는 과도한 자신감이 깔려 있다. '한국은 미국이 반대하지 않으면 언제든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다'는 논리다. 근거 없는 얘기는 아니다. 원전을 50년 가까이 운용한 노하우가 있고, 유럽과 중동에 수출까지 하는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손꼽히는 원자력 기술력을 갖고 있다. 핵탄두를 탑재하는 미사일도 세계 최고 수준이다.
그럼에도 핵보유는 상상 이상의 비용을 요구한다. 국제사회의 압박과 제재는 미국을 설득해 해결한다 하더라도 보유비용이라는 현실적 장벽에 가로막힌다. 핵탄두는 엄격하게 통제된 시설에 보관해야 하며, 방사능을 차단하는 여러 겹의 안전 장치가 필요하다. 성능이 저하될 수 있기 때문에 정기적인 검사와 유지관리를 해야 하는데, 재래식 무기와 비교할 수 없는 고가의 장비와 기술을 요구한다. 핵무기의 운용과 관련된 통제 시스템도 첨단 설비의 집약체다. 외부로부터의 테러, 해킹을 완벽하게 방어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이유로 미국도 핵무기 유지관리 비용으로만 매년 수백억 달러를 쓰고 있다. 주민 반대로 변전소도 제대로 짓지 못하는 우리나라는 핵농축·재처리 시설과 같은 고위험 시설을 짓기까지의 갈등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박만원 논설위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화제의 뉴스
오늘의 이슈픽
인기 영상
가장 많이 본 뉴스
- 1[내일날씨] 월요일 출근길도 한파…아침 최저 -12...
- 2가상화폐 거래소 바이비트, 2조원대 해킹 피해…"북...
- 3[내일날씨] 대체로 맑음…아침 최저 기온 -12도
- 4얼어붙은 IPO 시장…공모주 펀드 설정액, 1천30...
- 5“4억 줍줍 나올까”...올림픽파크포레온, 1억 낮...
- 6매일경제TV증시 오늘 ‘핫이슈’“미국의 중국 선사 ...
- 7[생생한 주식쇼 생쇼] 케이엔솔(053080), 액...
- 8[생생한 주식쇼 생쇼] 전진건설로봇(079900),...
- 9[생생한 주식쇼 생쇼] 풀무원(017810), K-...
- 10[생생한 주식쇼 생쇼] 엠오티(413390), 삼성...
투데이 포커스
화제의 뉴스
포토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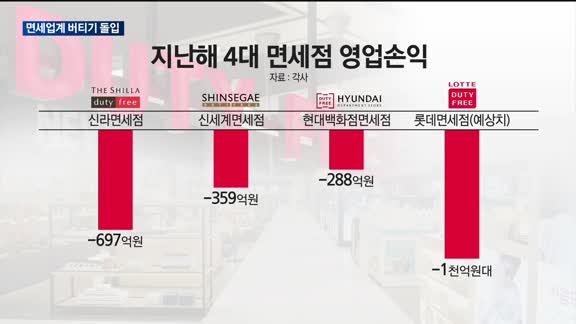
![[집중취재] 대체거래소 출범·공매도 재개…국장 향방은?](https://imgmm.mbn.co.kr/vod/news/103/2025/02/20/20250220170305_10_103_0_MM1005475103_4_24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