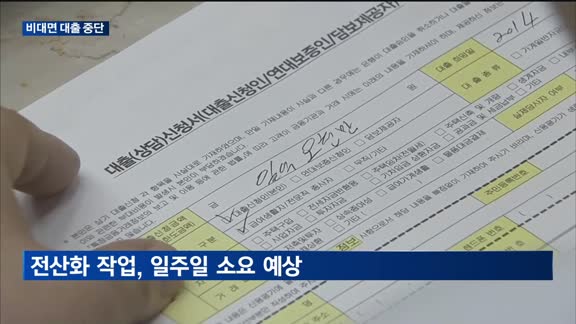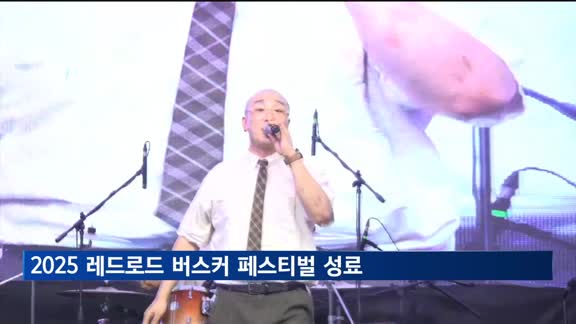|
첨단 산업의 비타민으로 불리는 희토류 공급망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한층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달 1일부터 핵심 광물의 안보에 무게를 둔 '신(新)광물자원법'이 시행되기 때문이다. 중국은 이 법을 통해 첨단 산업의 필수 원료인 핵심 광물 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을 확대하고 관리 체계를 개선할 계획이다.
30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7월 1일부터 '중화인민공화국 광물자원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지난해 11월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2차 회의에서 통과된 개정안은 국가 광물 자원 안전을 보장하고 광업의 고품질 발전을 촉진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자원 안보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일례로 법률 조항에 '국가 광물 자원 안보'를 명시했고, 안보 차원에서 전략 광물을 관리하도록 했다. 해외 자원 개발 지원을 의무화하고, 국가 자원 비축 체계를 법제화할 뿐 아니라 광물 자원 감독기관도 신설한다.
중국 자연자원부는 "광물 자원은 발전의 기초이자 생산의 핵심이며 산업의 혈액"이라고 개정안 시행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광물 자원은 경제·사회 발전의 중요한 물질적 기초"라며 "광물 자원의 탐사 개발은 국가 경제와 민생, 국가 안보와 관련 있다"고 강조했다.
개정안 시행은 중국이 다른 나라와의 분쟁 때마다 꺼내든 '자원 무기화'와도 무관하지 않다. 중국은 2010년 일본과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분쟁 때 처음으로 '희토류 수출 통제' 카드를 꺼냈다. 지난 1월 출범한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중국산 수입품에 '추가 관세'를 매겼다. 이에 중국은 2월 텅스텐 등 5종 광물, 4월 디스프로슘 등 7종 희토류 수출을 통제했다. 상호관세율을 세 자릿수까지 끌어올리며 치열했던 미·중 무역전쟁은 5월 '제네바 협상'과 한 달 뒤 '런던 협상'을 통해 휴전에 들어갔다. 그럼에도 불확실성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상호관세율 유예기간이 끝나는 오는 8월까지 미·중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중국이 추가적으로 희토류 수출을 통제할 수 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최근 중국 상무부는 통제 목록에 없던 제품에 대한 추가 검사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희토류는 란타넘 계열 15개 원소와 스칸듐·이트륨을 합친 17개 원소를 총칭한다. 17개 중 중국이 수출을 통제한 것은 7종이다. 아직까지 수출을 통제할 수 있는 희토류가 10종이나 남았다는 얘기다. 10종 중 수출 통제 시 영향이 가장 큰 것은 영구자석의 핵심 소재인 네오디뮴이다. 중국은 전 세계 네오디뮴의 80~90%를 생산하며, 90% 이상을 가공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제네바 협상 이후 다급하게 런던 협상을 추진한 것도 영구자석 소재인 디스프로슘과 사마륨이 수출 통제 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많다. 이 중에서도 디스프로슘은 중국에서만 생산된다. 영구자석은 전기차와 로봇, 전자기기, 방위 산업 등 첨단 산업에 주로 쓰인다.
[베이징 송광섭 특파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화제의 뉴스
오늘의 이슈픽
인기 영상
가장 많이 본 뉴스
- 1글로벌인재교육개발원, 키르기스스탄 교육부와 교육협력...
- 2SK이노베이션, 3분기 수익 개선 전망…'주가 25...
- 3대출 규제 발표에…은행권 비대면 대출 중단
- 4증시 오늘 '핫이슈'…"SK이노베이션 깜짝 '상한가...
- 5현대차증권, '책무 이행 결의대회' 개최…"책임 있...
- 6고려아연 '상호주' 2심 승소…승리의 주역은 율촌·...
- 7[주간증시전망] 정책 기대 여전하지만…미 경제지표·...
- 8매일경제TV증시 오늘 ‘핫이슈’ “갑작스런 스테이블...
- 9[생생한 주식쇼 생쇼] 한국화장품 (123690) ...
- 103분기 실적 개선 전망에···SK이노베이션 하루새 ...
투데이 포커스
화제의 뉴스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