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8일 열린 매일경제신문 '대한민국 리부팅 포럼'에서는 인공지능(AI) 시대 대응을 위한 제언이 쏟아졌다. 정부는 전력망을 포함한 인프라스트럭처를 국가가 나서서 깔고, 이미 AI는 자체 개발에 늦은 만큼 AI를 산업 분야에 활용하는 솔루션을 개발하는 데 공을 들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AI 시대에 부족한 인프라의 대표적인 사례가 전력망이다. 이우현 OCI홀딩스 회장은 "카이스트에 전자공학 교수는 50명이 넘는데 전기공학 교수는 2명뿐이라는 얘기를 들었다"면서 "특히 전기·전력 분야에서 한국은 후진국"이라고 지적했다.
AI는 필연적으로 대규모 데이터센터를 필요로 하는데, 이들 데이터센터는 막대한 양의 전기를 쓴다. 하지만 국내에는 이만한 양의 전기를 생산할 발전소도, 생산한 전기를 옮겨올 송전망도 부족하다.
AI 서버를 구축하기 위한 그래픽처리장치(GPU) 확보도 이슈다. 김석환 한세예스24홀딩스 부회장은 "일본은 국가 단위에서 GPU를 사들이고 있다"며 "한국은 아무런 준비가 안 돼 있다"고 말했다. AI 서버 한 대를 구축하는 데 드는 비용은 10억원 정도다. 정부 지원이 없다 보니 기업들은 GPU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김 부회장은 "국내에서 제일 많이 AI용 서버를 사는 기업은 삼성전자인데, 10대 사는 정도에 머무르고 있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박선영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글로벌 수준의 AI는 미국과 중국이 가져가게 될 것"이라며 "냉정하게 한국은 글로벌 레벨의 AI를 가져갈 수준이 아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그렇다면 우리는 네이버처럼 국내용 AI를 개발해 국내 AI 시장은 지켜낼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나아가 "AI를 방산, 조선, 완성차처럼 국내 기업들이 잘하는 제조업 분야에 접목하는 방법을 찾아볼 필요도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중국에 비해 우위를 가져가기 쉬운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해 '니치마켓(틈새시장)'을 공략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수민 UCK파트너스 대표는 "예전에 한 업체를 찾았는데, 이 회사는 떡볶이용 떡을 썩지 않게 보관·운송하는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소개했다. 그는 "이 회사는 해당 사업으로 한 해에 매출 500억원을 올리는데 전부 수출한다"면서 "그럼에도 이 분야는 첨단 산업이 아니라고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엔터테인먼트나 소비재 중에는 한국이 비교 우위를 가지고 있고 중국은 중점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분야가 있다"면서 "이런 분야에서 국가 성장동력 역할을 할 새로운 산업이 나올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박제완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I 시대에 부족한 인프라의 대표적인 사례가 전력망이다. 이우현 OCI홀딩스 회장은 "카이스트에 전자공학 교수는 50명이 넘는데 전기공학 교수는 2명뿐이라는 얘기를 들었다"면서 "특히 전기·전력 분야에서 한국은 후진국"이라고 지적했다.
AI는 필연적으로 대규모 데이터센터를 필요로 하는데, 이들 데이터센터는 막대한 양의 전기를 쓴다. 하지만 국내에는 이만한 양의 전기를 생산할 발전소도, 생산한 전기를 옮겨올 송전망도 부족하다.
AI 서버를 구축하기 위한 그래픽처리장치(GPU) 확보도 이슈다. 김석환 한세예스24홀딩스 부회장은 "일본은 국가 단위에서 GPU를 사들이고 있다"며 "한국은 아무런 준비가 안 돼 있다"고 말했다. AI 서버 한 대를 구축하는 데 드는 비용은 10억원 정도다. 정부 지원이 없다 보니 기업들은 GPU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김 부회장은 "국내에서 제일 많이 AI용 서버를 사는 기업은 삼성전자인데, 10대 사는 정도에 머무르고 있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박선영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글로벌 수준의 AI는 미국과 중국이 가져가게 될 것"이라며 "냉정하게 한국은 글로벌 레벨의 AI를 가져갈 수준이 아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그렇다면 우리는 네이버처럼 국내용 AI를 개발해 국내 AI 시장은 지켜낼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나아가 "AI를 방산, 조선, 완성차처럼 국내 기업들이 잘하는 제조업 분야에 접목하는 방법을 찾아볼 필요도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중국에 비해 우위를 가져가기 쉬운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해 '니치마켓(틈새시장)'을 공략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수민 UCK파트너스 대표는 "예전에 한 업체를 찾았는데, 이 회사는 떡볶이용 떡을 썩지 않게 보관·운송하는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소개했다. 그는 "이 회사는 해당 사업으로 한 해에 매출 500억원을 올리는데 전부 수출한다"면서 "그럼에도 이 분야는 첨단 산업이 아니라고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엔터테인먼트나 소비재 중에는 한국이 비교 우위를 가지고 있고 중국은 중점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분야가 있다"면서 "이런 분야에서 국가 성장동력 역할을 할 새로운 산업이 나올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박제완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화제의 뉴스
오늘의 이슈픽
인기 영상
가장 많이 본 뉴스
- 1백종원 고개 숙이자…"한때 1위 '빽다방', 날개 ...
- 2코스트코 노조 "공휴일 연차 무단결근처리" 특별근로...
- 3[매일경제TV 극찬기업] 도담도담 산후도우미·럼플리...
- 4이천 대형 물류센터서 화재 진화중…소방 "110명 ...
- 5한한령 해제 기대에 엔터주 신고가 랠리
- 6벼랑 끝 백종원, 성난 민심 달래기?…더본코리아 ‘...
- 7한국 경제성장률 '0%대 전망'…석 달만에 반토막
- 8[이야기를 담다] 탐나라공화국 강우현 상상감독…"상...
- 9"여름 성수기 잡아라"…여행업계, 최대규모 할인경쟁...
- 10홈플러스, 협상 결렬 17개 점포에 계약 해지 통보
투데이 포커스
화제의 뉴스
포토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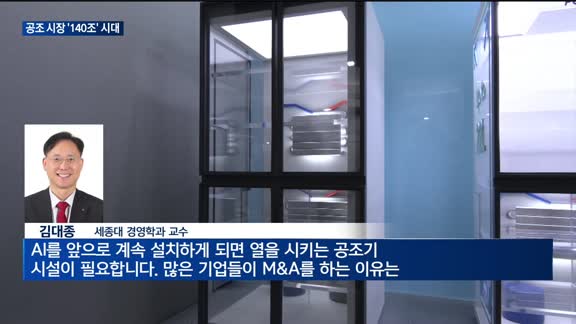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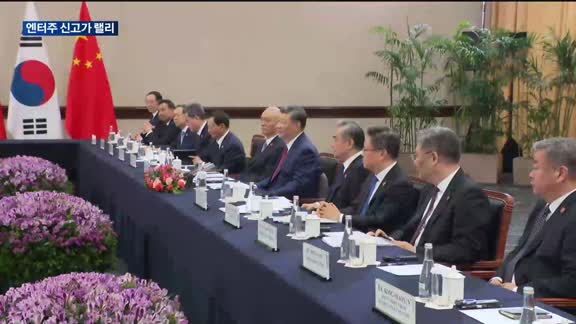





![[집중취재] 스트레스 DSR 3단계, 이달 중 '윤곽'…막차 수요 우려](https://imgmm.mbn.co.kr/vod/news/103/2025/05/15/20250515163959_10_103_0_MM1005555297_4_24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