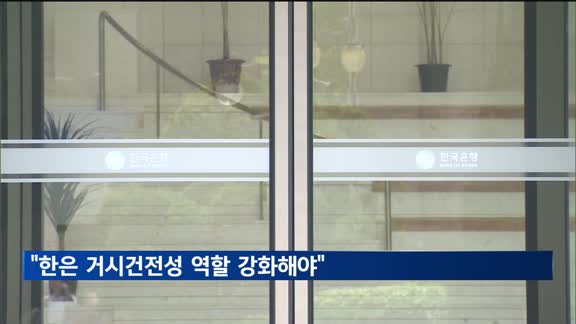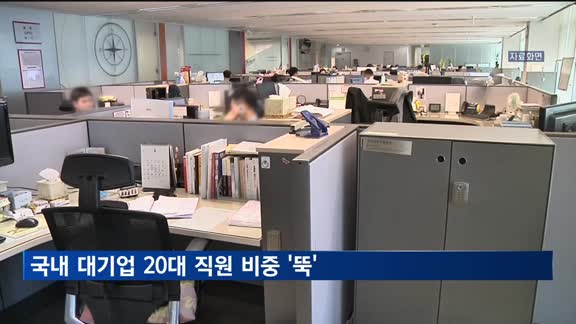【 앵커멘트 】
앞에서 보신 것처럼 금융회사들은 파생결합증권, DLS가 주식보다 위험이 낮고, 금리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품이라며 권유해왔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개인 투자자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자산관리수단이라고 하기엔 어렵다고 말합니다.
이나연 기자입니다.
【 기자 】
저성장, 고령화시대가 심화하면서 금리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는 DLS와 같은 금융투자상품 수요는 증가해왔습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DLS 발행잔액은 16조4천8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10년 만에 4배 가량 성장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문제가 된 상품은 해외 금리 연계 DLS.
이 상품은 금리가 기준 범위 안에 있는 한, 연 3~4%의 수익을 올릴 수 있고, 만기가 짧아 재투자가 쉽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준 범위 이하로 내려가면 큰 손실이 발생합니다.
특히, 우리은행이 판매한 상품은 독일 국채 금리가 -0.25% 이상이면 수익을 낼 수 있지만, 글로벌 경기 침체로 최근 -0.5%대까지 떨어지면서, 투자금을 거의 다 날릴 상황.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DLS 상품을 리테일에서 판매한 금액만 약 7천800억 원, 유안타와 미래에셋, NH 등 증권사에서 판 것까지 합치면 약 8천억 원 가량입니다.
이 가운데 개인투자자 3천654명이 투자한 금액은 7천326억 원으로, 전체 판매잔액의 89.1%를 차지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지난 2015년 홍콩H지수가 급락하면서 발생한 ELS 사태와 달리, 이번 DLS 대란은 만기가 짧고 손실 확정 금액이 크다는 것.
▶ 인터뷰(☎) : 이효섭 /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DLS는 만기가 짧고요. ELS는 만기가 길어서 자동조기상환이 안됐더라도 조금 더 기다려보면 만기 때까지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반면에, DLS 상품은 만기가 짧은 상품이고 이미 기초지수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돼있고 만기에 이미 근접해있는 상품들이 많아서 손실이 확정된 비중이 높습니다."
계속 존재했던 상품이었지만, 또 다시 불완전판매 이슈가 불거진 이유가 뭘까.
▶ 인터뷰(☎) : 이효섭 /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고위험 사모 연계 펀드나 사모 연계 신탁을 팔게 되면 1% 이상 (선취수수료) 바로 받을 수가 있거든요. 은행들이 수익을 높이기 위해서 고객의 수익이 증가됐을 때 보수를 많이 받아가는 게 아니라 은행 위험상품을 많이 팔아서 은행 수익이 높아지는 구조로 보수 체계가 설계돼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불완전판매가 이뤄졌을 경우, 확실하게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며, 선진국처럼 과징금 제도를 탄탄하게 설계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매일경제TV 이나연입니다.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앞에서 보신 것처럼 금융회사들은 파생결합증권, DLS가 주식보다 위험이 낮고, 금리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품이라며 권유해왔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개인 투자자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자산관리수단이라고 하기엔 어렵다고 말합니다.
이나연 기자입니다.
【 기자 】
저성장, 고령화시대가 심화하면서 금리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는 DLS와 같은 금융투자상품 수요는 증가해왔습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DLS 발행잔액은 16조4천8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10년 만에 4배 가량 성장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문제가 된 상품은 해외 금리 연계 DLS.
이 상품은 금리가 기준 범위 안에 있는 한, 연 3~4%의 수익을 올릴 수 있고, 만기가 짧아 재투자가 쉽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준 범위 이하로 내려가면 큰 손실이 발생합니다.
특히, 우리은행이 판매한 상품은 독일 국채 금리가 -0.25% 이상이면 수익을 낼 수 있지만, 글로벌 경기 침체로 최근 -0.5%대까지 떨어지면서, 투자금을 거의 다 날릴 상황.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DLS 상품을 리테일에서 판매한 금액만 약 7천800억 원, 유안타와 미래에셋, NH 등 증권사에서 판 것까지 합치면 약 8천억 원 가량입니다.
이 가운데 개인투자자 3천654명이 투자한 금액은 7천326억 원으로, 전체 판매잔액의 89.1%를 차지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지난 2015년 홍콩H지수가 급락하면서 발생한 ELS 사태와 달리, 이번 DLS 대란은 만기가 짧고 손실 확정 금액이 크다는 것.
▶ 인터뷰(☎) : 이효섭 /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DLS는 만기가 짧고요. ELS는 만기가 길어서 자동조기상환이 안됐더라도 조금 더 기다려보면 만기 때까지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반면에, DLS 상품은 만기가 짧은 상품이고 이미 기초지수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돼있고 만기에 이미 근접해있는 상품들이 많아서 손실이 확정된 비중이 높습니다."
계속 존재했던 상품이었지만, 또 다시 불완전판매 이슈가 불거진 이유가 뭘까.
▶ 인터뷰(☎) : 이효섭 /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고위험 사모 연계 펀드나 사모 연계 신탁을 팔게 되면 1% 이상 (선취수수료) 바로 받을 수가 있거든요. 은행들이 수익을 높이기 위해서 고객의 수익이 증가됐을 때 보수를 많이 받아가는 게 아니라 은행 위험상품을 많이 팔아서 은행 수익이 높아지는 구조로 보수 체계가 설계돼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불완전판매가 이뤄졌을 경우, 확실하게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며, 선진국처럼 과징금 제도를 탄탄하게 설계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매일경제TV 이나연입니다.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화제의 뉴스
오늘의 이슈픽
인기 영상
가장 많이 본 뉴스
- 1가상화폐 3개 법안 미 하원 통과…'엑스알피' 최고...
- 2K-방산주, 조정 후 반등…하반기 날아오를까
- 3[집중취재] 한미 관세협상 본게임…막판 '조율 진통...
- 4"SK하이닉스 2026년 HBM 물량 확정까지는 노...
- 5[밸류업5000] 밸류업에서 상법개정까지…금융주 질...
- 6[경제토크쇼픽] 이창영 “지방은행 개념 ‘지역은행’...
- 7증시 오늘 '핫이슈'…"MSCI 8월 정기변경 심사...
- 8'홈케어'가 바꾼 가전…'셀프케어' 열풍에 웰니스 ...
- 9이재용, 10년 사법리스크 털었다…재계 "한국경제에...
- 10엔지더블유, 늘푸른농장과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
투데이 포커스
화제의 뉴스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