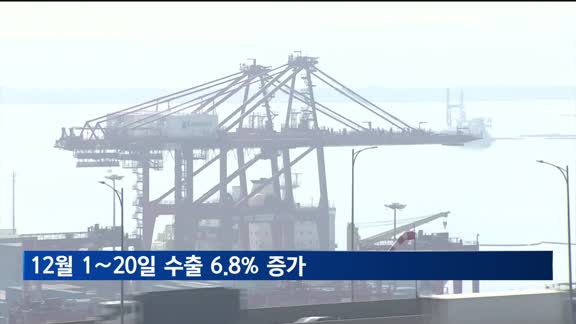|
|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경 |
롯데그룹이 최근 정기 임원인사를 단행했다. 계열사 대표이사급 21명을 교체했고, 전체 임원의 22%가 짐을 쌌다. 임원단은 모두 충원하지 않고 13%를 감축했다. 롯데가 유동성 위기로 모라토리엄(지급유예)을 선언할 수도 있다는 허위 지라시를 비롯해 안팎의 위기설을 타개하고 분위기를 일신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사업의 혁신은 보이지 않는다. 1986년생 신유열 전무가 부사장으로 승진했다거나, 롯데케미칼 회사채 신용도를 유지하기 위해 롯데월드타워를 담보로 내놨다거나, 계열사의 부동산 자산을 매각할지도 모른다는 얘기만 흘러나왔다. 임직원 규모 축소나 부동산 매각은 일종의 구조조정이지 혁신이나 쇄신이 아니다. 말하자면 혁신이라는 ‘업의 본질’과는 다른 방침만 나오고 있다.
유통업의 본질이 부동산이라는 강력한 정의 때문일까. 롯데를 비롯한 국내 유통업계는 오랜 기간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 혁신에 부족했다. 나름 각고의 노력이 있었겠지만, 쿠팡이 업계를 평정하고 알리·테무 등 중국 플랫폼이 휩쓰는 동안 힘을 쓰지 못했다. 쇼핑의 주무대가 온라인으로 옮겨가면서 필연적으로 함께 바뀌기 마련인 업의 본질을 살피지 못한 셈이다.
물론 지금 롯데 위기의 가장 근본에는 롯데케미칼이 있고, 중국 석유화학 산업의 치킨게임이 있다. 정부와 산업계가 이제라도 전략적으로 되짚으며 대책을 세우고 설명을 내놓아야 한다. 다만 그 대책이 부동산 매각 같은 근시안적 땜질일 수는 없다. 중국 업체들과의 경쟁에서 어떤 경쟁우위를 만들 수 있는지, 온라인으로 재편되는 유통업계에서 어떻게 자리를 지킬 것인지, 의사결정의 정밀함과 속도를 어떻게 올릴 수 있는지 등은 롯데뿐 아니라 모든 업계와 정부가 함께 머리를 짜내야 한다.
 |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화제의 뉴스
오늘의 이슈픽
인기 영상
가장 많이 본 뉴스
- 1[밸류업5000] 펀드 5천억 원 투입…꺼진 불씨 ...
- 2[생생한 주식쇼 생쇼] 로봇·탄소 포집 주목 종목 ...
- 3[생생한 주식쇼 생쇼] 트럼프 정책주·로봇주 집중 ...
- 4[생생한 주식쇼 생쇼] 실적 중심 투자 전략과 이노...
- 5[밸류업 5000] 삼성증권, 내년 밸류업 공시할 ...
- 6증시 오늘 '핫이슈'…"삼성생명과 삼성전자"
- 7혼다·닛산 '합병' 글로벌 3위로…현대차그룹 경쟁력...
- 8증시 오늘 '핫이슈'…"9월 이후 60% 급등 천연...
- 9SK엔펄스, 반도체 후공정 장비사업 분할하고 CMP...
- 10[내일날씨] 전국 흐리다 차차 맑음…수도권 미세먼지...
투데이 포커스
화제의 뉴스
포토뉴스

![[밸류업5000] 펀드 5천억 원 투입…꺼진 불씨 살릴까](https://imgmm.mbn.co.kr/vod/news/103/2024/12/24/20241224162752_10_103_0_MM1005431641_4_95.jpg)

![[집중취재] 메가캐리어 탄생부터 통합 LCC 출범까지…항공업계 판도 '확' 바뀐다](https://imgmm.mbn.co.kr/vod/news/103/2024/12/23/20241223170835_10_103_0_MM1005431583_4_277.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