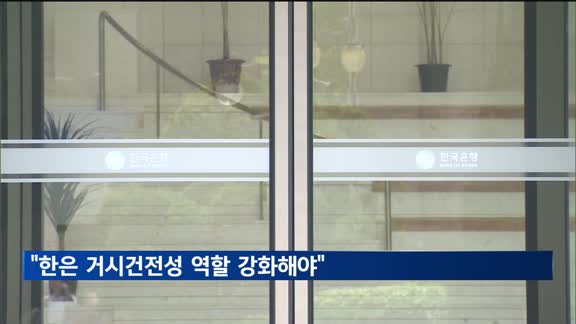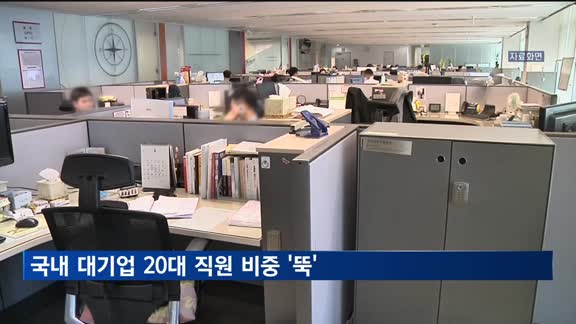|
포스코 '수소환원제철(HyREX)' 기술이 철강산업 탄소중립을 앞당길 혁신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다만 상용화 최대 변수로 막대한 전력 확보 문제가 걸림돌로 대두되고 있다. HyREX는 전통적인 고로(용광로)와 달리 석탄 대신 수소를 사용해 철을 생산하는 포스코의 독자기술이다.
탄소 배출을 최대 90%까지 저감할 수 있는 '게임체인저'로, 2050년 탄소중립 목표 실현의 핵심 수단으로 떠올랐다. 포스코는 2030년까지 HyREX 실증 플랜트(조강 30만t 규모)를 가동해 2035년 이후 상용 대규모 플랜트로 확대할 계획이다.
상용화의 가장 큰 허들은 막대한 전력 수요다. 세계철강협회에 따르면 수소환원제철로 조강 1t을 생산하려면 약 3MWh(메가와트시)의 전력이 필요하다. 이는 기존 고로 방식 대비 7~8배 이상 많은 양이다.
포스코 전체 조강 생산량(연 4000만t)을 HyREX로 모두 대체할 경우, 연간 약 1200만MWh에 달하는 전력이 필요하다. 이는 서울시 연간 전력 소비량(약 13TWh)의 약 10%에 해당하는 규모다.
탄소 저감 기술인 만큼 전력 역시 저탄소 전력으로 확보해야 한다는 문제도 있다. 하지만 국내 재생에너지(태양광·풍력 등)만으로 안정적으로 전력을 조달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포스코는 온실가스 배출이 거의 없는 원자력 발전을 해법으로 보고 원전 전력 직접구매 허용을 정부에 요청하고 있다. 전력 직접구매는 기업이 중간 판매상인 전력회사(한전 등) 없이 발전사업자와 장기 계약(보통 10~20년)을 맺어 전력을 구매하는 제도다. 다만 국내에선 아직 재생에너지만 전력 직구가 허용되며 '원전 직구' 시장은 허용되지 않고 있어 정부의 정책적 의지가 필요하다.
[정지성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화제의 뉴스
오늘의 이슈픽
인기 영상
가장 많이 본 뉴스
- 1가상화폐 3개 법안 미 하원 통과…'엑스알피' 최고...
- 2[밸류업5000] 밸류업에서 상법개정까지…금융주 질...
- 3"SK하이닉스 2026년 HBM 물량 확정까지는 노...
- 4'홈케어'가 바꾼 가전…'셀프케어' 열풍에 웰니스 ...
- 5[생생한 주식쇼 생쇼] 원익IPS (240810),...
- 6[투자능력고사] 주식남녀 / 반도체 vs 제약·바이...
- 7미국 주식 보관액 183조 원 '역대 최고'…테슬라...
- 8[생생한 주식쇼 생쇼] 엘앤에프 (066970), ...
- 9대구정책연구원, 'AX 수도 대구' 모델과 8대 전...
- 10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법안 미 상하원 통과…트럼프 서...
투데이 포커스
화제의 뉴스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