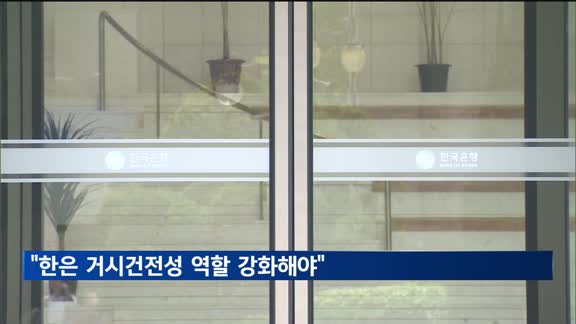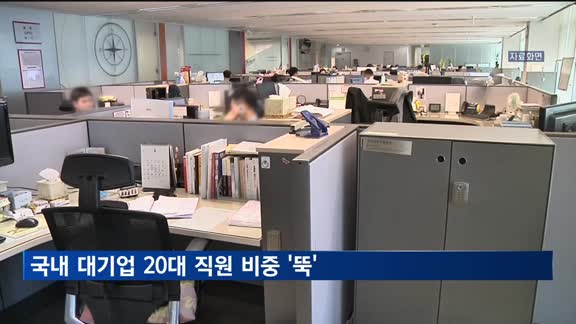|
지금부터 정확히 100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 20세기 연표를 보면 2차 세계대전과 유대인 집단학살의 비극을 부른 히틀러의 저작 '나의 투쟁'이 1925년에 발간됐다. 현대적 집단안보체제의 뿌리가 된 로카르노 조약도 맺어진 해였다. 더불어 인류의 호기심이 큰 결실을 맺었던 사안에도 눈길이 간다.
1925년엔 인류의 우주에 대한 이해를 도약시킨 두 가지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여성 천문학자 세실리아 페인가포슈킨은 밤하늘의 별(항성)이 헬륨이나 수소 같은 가스로 이루어져 있다는 논문을 발표했다. 별이 고온의 불타는 금속이라고 생각했던 당시엔 놀랄 만한 주장이었다. 천문학계 거목들도 이 논문에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낼 정도로 세간의 상식을 파괴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또 같은 해 천문학자 에드윈 허블은 안드로메다은하가 태양과 지구가 속해 있는 은하의 구성원이 아니라 별개 은하라는 사실을 발표했다. 이후 현대 천문학은 외부 은하가 셀 수 없이 많고, 우주의 크기도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광대하다는 것을 밝혀냈다. 우리가 갖고 있던 우주에 대한 이해의 폭을 단숨에 다른 차원으로 확장시킨 관측이자 이를 과학적으로 입증해낸 업적이었다.
이런 성과는 수학·물리학·화학 등 기초 학문, 그리고 관측과 계산을 위한 공학 발전의 종합적 산물이다. 과학자들의 연구는 단순히 우주의 궁금증을 푸는 데 기여했을 뿐 아니라 파생 기술과 정보를 통해 인류의 삶과 생활에 직간접적으로 공헌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든 원동력은 호기심이었다.
나는 올해 입학식에서 신입생들에게 몇 가지 조언을 했다. 그중 첫 번째가 '호기심과 궁금함을 멈추지 말라'는 당부였다. 단순히 정해진 답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질문하고 탐색하는 과정에서 크게 성장할 것이라는 얘기였다.
2025년 대한민국의 청년과 어린이들에게 호기심과 의지만 있다면 글로벌 무대에서 꿈을 펼칠 환경은 이미 조성되어 있다. 100년 전 선진국의 성과를 이해하기도 벅찼던 한국이 이제는 NASA와 공동 개발한 우주망원경 '스피어엑스'로 우주의 비밀을 풀기 시작했다. 미국에 직접 체류한 경험이 없는 우리 학교 학생 중에서도 NASA의 인턴십에 합격해 일하는 친구가 있다.
하지만 최근 인공지능(AI) 도구가 크게 발전하면서 청년과 어린이들이 손쉽게 답을 구하는 요령만 배우는 것 아닌가 걱정도 된다. 호기심은 과학기술 분야의 성과를 내는 데만 사용되지 않는다. 경쟁력 있는 개인, 좋은 상품과 서비스를 만드는 기업,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데도 호기심은 강력하게 작동한다. 우리 청년과 어린이들은 호기심을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에 대해 활발히 토론하고, 폭넓은 시야를 키워야 한다.
'늙는다는 것'은 곧 '호기심을 잃는 것'이라는 말이 있다. 우리 사회와 교육이 청년과 어린이들에게 지름길과 정해진 답만 알려줘선 안된다. 이들의 호기심과 도전이 격려받고 존중받기를 간절히 바란다.
[원종필 건국대 총장]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화제의 뉴스
오늘의 이슈픽
인기 영상
가장 많이 본 뉴스
- 1가상화폐 3개 법안 미 하원 통과…'엑스알피' 최고...
- 2[밸류업5000] 밸류업에서 상법개정까지…금융주 질...
- 3"SK하이닉스 2026년 HBM 물량 확정까지는 노...
- 4'홈케어'가 바꾼 가전…'셀프케어' 열풍에 웰니스 ...
- 5[생생한 주식쇼 생쇼] 원익IPS (240810),...
- 6미국 주식 보관액 183조 원 '역대 최고'…테슬라...
- 7[투자능력고사] 주식남녀 / 반도체 vs 제약·바이...
- 8[생생한 주식쇼 생쇼] 엘앤에프 (066970), ...
- 9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법안 미 상하원 통과…트럼프 서...
- 10대구정책연구원, 'AX 수도 대구' 모델과 8대 전...
투데이 포커스
화제의 뉴스
포토뉴스